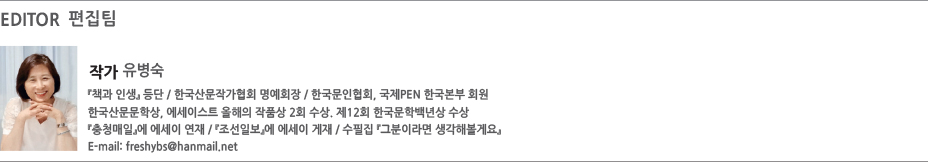커뮤니티

[수필] 춤과 함께
2024-04-24
문화
 문화놀이터
문화놀이터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수필] 춤과 함께
'글. 유병숙'
어린 손녀가 봄볕 가득한 마당에서 춤을 춘다. 나도 모르게 빠져든다. 작은 몸 어디에 그런 흥이 살고 있는 걸까? 음악이 들려오면 자동으로 흔들어대는 걸 보며 아하, 춤은 인간의 본능이구나 했다. 갑갑한 날에는 한바탕 춤이라도 추고 나면 속이 후련해질 것도 같았다. 나의 라인댄스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라인댄스 강사가 회원들을 불러 모았다. 얼마 있으면 ‘버들잎 축제’ 공연이 열린단다. 그간 쌓은 기량을 주민들에게 선보일 기회라며 회원 모두 참여해 달라고 했다. 라인댄스를 배운 지 고작 일 년 남짓인데 이런 기회를 얻게 되다니! 공연히 가슴이 설레었다.

며칠 후 강사는 열 명의 공연자를 뽑겠다고 말했다. 깜짝 놀랐다. 모두가 하는 줄 알고 구경 오라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자랑까지 늘어놓았는데…. 잘못 듣고 착각했나? 어리둥절해졌다.
먼저 베테랑들이 선발되었으나 몇몇이 손사래를 쳤다. 강사의 목소리가 커졌다. 일일이 이름을 부르며 참여를 독려했다. 공연은 문학기행 일정과 겹쳐 있었다. 내 이름이 불리면 어쩌나 괜스레 마음을 졸였다. 내 옆자리 반원의 이름이 불렸다. 그런데 그녀는 제사라 어렵단다. 회장은 그녀에게 다가와 거듭 당부했다. 그러나 나는 본둥만둥 스쳐 지나갔다.
아바(ABBA)의 노래 ‘슈퍼 트루퍼(Super Trouper)’가 흘러나오자 이 곡으로 공연할 거라며 그날따라 동작마다 설명이 길어졌다. 강당은 순식간에 공연 모드로 바뀌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춤을 추던 나는 시간이 갈수록 뜬금없이 서운한 감정이 복받쳤다. 호명되지 않은 사람은 신입을 비롯해 몇 되지 않았다.
춤에 서툰 건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언감생심 이름이 불리길 은근히 바랐다.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회원들에게 강사의 배려 한마디쯤 있겠지 기대했다. 강사는 무대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응원을 와야 한단다. 그렇지만 나는 이도 저도 아닌 형편에 놓여있었다. 참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인데도 무슨 벌칙이라도 받는 양 기분이 착잡했다.
물론 행사를 멋지게 잘 치러내야 라인댄스 반의 위세가 빛난다는 것쯤은 모두가 아는 일이다. 먼저 배운 이들이 출연하는 것이야 당연지사, 문제는 출연자들 중에 나보다 뒤늦게 시작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끝내 내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나는 그날, 말의 과장을 보태,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유령이 된 듯했다.
음악에 따라 동작이 바뀌는 라인댄스는 한 번만 빠져도 따라잡기가 힘들다. 그런 까닭으로 바쁜 일을 제치기도 하고, 모임에 빠지는 날도 있었다. 이만큼이나 하느라 애쓴 내가 갑자기 가여워졌다. 음악이 귓등을 타고 튕겨 나갔다. 까닭 없이 얼굴이 화끈거렸다.
수업이 끝난 후 정릉천을 하염없이 걸었다. 찬바람이 불어와 마음을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다. 몰랐던 관종끼가 숨어있었던 걸까? 그간 앉을 자리 설 자리 모르고 살아온 건 아니었을까? 온갖 자책성 상념이 몰아쳤다.
선택받지 못했다 해서 갈팡질팡하는 심사를 당최 모르겠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불행은 남과의 비교에서 온다.”고 했다. 왜곡된 거울에 줄곤 나를 비추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같이 걷던 친구가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하며 어깨를 툭 친다. 속말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렇게 서운하면 저도 한번 해 볼게요! 하지 그랬어? 하며 웃는다. 정신이 번쩍 났다.
라인댄스를 출 때마다 늘 뒤통수가 따가웠다. 못 한다고 누군가 비웃고 있지 않을까 진땀을 흘렸다. 잘하면 어떻고, 못 추면 또 어떤가. 나는 부지불식간에 타자들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고 있었다.
오래전에 읽었던 《그리스인 조르바》가 떠올랐다. 조르바는 마음에서 우러나는대로 몸을 흔들면 그것이 바로 춤이라 했다. 춤을 통해 그는 자유를 만끽했다. 책을 읽으며 나는 자유로부터 얼마나 멀리 와 있는 걸까? 되묻곤 했다. 앤서니 퀸(조르바 역)과 앨런 베이츠(바질 역)가 출연한 동명의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두 주인공은 어깨를 겯고 춤을 추었다. 나는 그 모습에 얼마나 공명했던가. 영화에 몰입하는 동안 몸 안에 갇혀 있던 춤이 꿈틀대었다.
조르바를 읽을 때만 해도 나는 춤을 자유로 느끼지 않았던가. 따지고 보면 나는 라인댄스를 통해 자유를 살고 있었다.

정릉천을 돌아 나와 시장을 보았다. 며칠 후면 이곳에서 행사가 열릴 것이다. 무대가 펼쳐질 광장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노랑, 진홍, 보라 등 색색의 국화 화분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행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을 실감했다.
과일가게에 들러 연습하는 회원들에게 줄 과일을 고를 때였다. 바깥에서 가게 속으로 영화 〈플래시댄스〉의 OST ‘What A Feeling’이 뛰어 들어왔다.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진원지를 찾을 수 없었다. 등과 팔에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춤동작 모드로 들어서고 있었다.
라인댄스 강사가 회원들을 불러 모았다. 얼마 있으면 ‘버들잎 축제’ 공연이 열린단다. 그간 쌓은 기량을 주민들에게 선보일 기회라며 회원 모두 참여해 달라고 했다. 라인댄스를 배운 지 고작 일 년 남짓인데 이런 기회를 얻게 되다니! 공연히 가슴이 설레었다.

며칠 후 강사는 열 명의 공연자를 뽑겠다고 말했다. 깜짝 놀랐다. 모두가 하는 줄 알고 구경 오라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자랑까지 늘어놓았는데…. 잘못 듣고 착각했나? 어리둥절해졌다.
먼저 베테랑들이 선발되었으나 몇몇이 손사래를 쳤다. 강사의 목소리가 커졌다. 일일이 이름을 부르며 참여를 독려했다. 공연은 문학기행 일정과 겹쳐 있었다. 내 이름이 불리면 어쩌나 괜스레 마음을 졸였다. 내 옆자리 반원의 이름이 불렸다. 그런데 그녀는 제사라 어렵단다. 회장은 그녀에게 다가와 거듭 당부했다. 그러나 나는 본둥만둥 스쳐 지나갔다.
아바(ABBA)의 노래 ‘슈퍼 트루퍼(Super Trouper)’가 흘러나오자 이 곡으로 공연할 거라며 그날따라 동작마다 설명이 길어졌다. 강당은 순식간에 공연 모드로 바뀌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춤을 추던 나는 시간이 갈수록 뜬금없이 서운한 감정이 복받쳤다. 호명되지 않은 사람은 신입을 비롯해 몇 되지 않았다.
춤에 서툰 건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언감생심 이름이 불리길 은근히 바랐다.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회원들에게 강사의 배려 한마디쯤 있겠지 기대했다. 강사는 무대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응원을 와야 한단다. 그렇지만 나는 이도 저도 아닌 형편에 놓여있었다. 참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인데도 무슨 벌칙이라도 받는 양 기분이 착잡했다.
물론 행사를 멋지게 잘 치러내야 라인댄스 반의 위세가 빛난다는 것쯤은 모두가 아는 일이다. 먼저 배운 이들이 출연하는 것이야 당연지사, 문제는 출연자들 중에 나보다 뒤늦게 시작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끝내 내 이름은 불리지 않았다. 나는 그날, 말의 과장을 보태,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유령이 된 듯했다.
음악에 따라 동작이 바뀌는 라인댄스는 한 번만 빠져도 따라잡기가 힘들다. 그런 까닭으로 바쁜 일을 제치기도 하고, 모임에 빠지는 날도 있었다. 이만큼이나 하느라 애쓴 내가 갑자기 가여워졌다. 음악이 귓등을 타고 튕겨 나갔다. 까닭 없이 얼굴이 화끈거렸다.
수업이 끝난 후 정릉천을 하염없이 걸었다. 찬바람이 불어와 마음을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다. 몰랐던 관종끼가 숨어있었던 걸까? 그간 앉을 자리 설 자리 모르고 살아온 건 아니었을까? 온갖 자책성 상념이 몰아쳤다.
선택받지 못했다 해서 갈팡질팡하는 심사를 당최 모르겠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불행은 남과의 비교에서 온다.”고 했다. 왜곡된 거울에 줄곤 나를 비추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같이 걷던 친구가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하며 어깨를 툭 친다. 속말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그렇게 서운하면 저도 한번 해 볼게요! 하지 그랬어? 하며 웃는다. 정신이 번쩍 났다.
라인댄스를 출 때마다 늘 뒤통수가 따가웠다. 못 한다고 누군가 비웃고 있지 않을까 진땀을 흘렸다. 잘하면 어떻고, 못 추면 또 어떤가. 나는 부지불식간에 타자들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며 살고 있었다.
오래전에 읽었던 《그리스인 조르바》가 떠올랐다. 조르바는 마음에서 우러나는대로 몸을 흔들면 그것이 바로 춤이라 했다. 춤을 통해 그는 자유를 만끽했다. 책을 읽으며 나는 자유로부터 얼마나 멀리 와 있는 걸까? 되묻곤 했다. 앤서니 퀸(조르바 역)과 앨런 베이츠(바질 역)가 출연한 동명의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두 주인공은 어깨를 겯고 춤을 추었다. 나는 그 모습에 얼마나 공명했던가. 영화에 몰입하는 동안 몸 안에 갇혀 있던 춤이 꿈틀대었다.
조르바를 읽을 때만 해도 나는 춤을 자유로 느끼지 않았던가. 따지고 보면 나는 라인댄스를 통해 자유를 살고 있었다.

정릉천을 돌아 나와 시장을 보았다. 며칠 후면 이곳에서 행사가 열릴 것이다. 무대가 펼쳐질 광장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노랑, 진홍, 보라 등 색색의 국화 화분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행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을 실감했다.
과일가게에 들러 연습하는 회원들에게 줄 과일을 고를 때였다. 바깥에서 가게 속으로 영화 〈플래시댄스〉의 OST ‘What A Feeling’이 뛰어 들어왔다.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진원지를 찾을 수 없었다. 등과 팔에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춤동작 모드로 들어서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