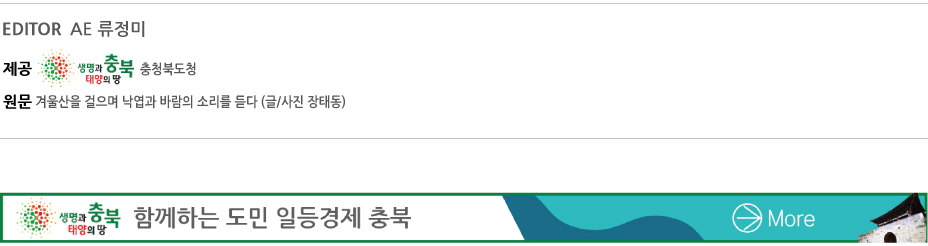커뮤니티

겨울산을 걸으며 낙엽과 바람의 소리를 듣다
2019-02-19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라이프
충북 어디까지 가봤니
겨울산을 걸으며 낙엽과 바람의 소리를 듣다
'증평 바람소리길'
좌구산자연휴양림 숲길을 걷는다. 오솔길에 떨어져 쌓인 갈잎을 밟으면 갈잎의 소리가 난다. 산비탈 촘촘한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 앙상한 빈가지의 소리가 들린다. 다 내주고 텅 비어 오히려 가득한 겨울산 오솔길에 문장 보다 더 깊은 행간의 뜻이 있다.
‘죽리에 피어나는 외로운 연기’를 생각하며
남북으로 길게 뻗은 증평군의 맨 남쪽에 좌구산이 자리 잡았다. 좌구산은 증평군 괴산군 청주시의 경계를 이룬다. 산의 형국이 거북이를 닮았다고 해서 거북 구(龜)자를 넣은, 좌구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좌구산 자락에는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끝내 자신의 뜻을 이룬 조선시대 후기 시인 김득신의 무덤이 있다. 증평에서 태어난 김득신은 어릴 때 앓은 병 때문에 책을 읽어도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 등 공부와 독서에 집중하기 어려운 처지였으나, 의지와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39살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고 59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과거 급제와 벼슬 보다 그는 시인으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으로 더 알려졌다. 다른 이들은 관직에서 물러날 나이에 관직에 나아갔으니, 그가 책을 읽고 시를 썼던 것은 입신양명의 뜻 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고 수신하려는 다짐이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은 독서에 관한 그의 일화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김득신은 <백이전>을 좋아해서 11만3천번을 읽었다고 하고 1만 번 이상 읽은 책이 36편이었다고 전한다. 다산 정약용은 그를 두고 ‘문자가 만들어진 이래 종횡으로 수천 년과 3만 리를 다 뒤져도 김득신만한 독서가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저물녘 난간에 기댄 늙은이/아득한 들녘 흥취에 끌리네/성긴 수풀에 지는 해 비꼈는데/쓸쓸한 주막엔 외로운 연기 피어오르네] -김득신 시비에 새겨진 시 <죽리의 외로운 연기>-
김득신은 죽리 주막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았을 것이다. 81세에 세상을 떠났으니, ‘저물녘 난간에 기댄 늙은이’는 김득신 자신이었겠지. 늙은 김득신의 눈에 든 풍경은 해질녘 들녘과 성긴 수풀, 그 아득함에 푹 빠진 늙은 마음은 결국 허공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주막집 굴뚝 연기와 같았으리라.
‘좌구산도 식후경’
증평읍내에서 좌구산자연휴양림으로 가는 길, 죽리를 지나면 김득신의 무덤이 있는 율리다. 율리, 우리말로 옮기면 ‘밤마을’ 정도 되겠다. 그 이름이 더 정답다. 좌구산자연휴양림 숲길을 크게 한 바퀴 돌아보는 일정이어서 좀 이르지만 점심을 먼저 먹기로 했다. ‘밤마을’에 있는 식당에서 구수한 담북장(청국장의 다른 말이다. 차림표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 청국장 보다는 담북장이라고 해야 그 맛이 더 사는 느낌이다.)에 밥 한 술 뜬다. 막걸리 한 사발로 목을 축이고 입맛을 돋운다. 어린 시절 질화로 위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던 고향집 담북장은 겨울이라서 더 맛있었다. 뚝배기 담북장과 막걸리에 추억이 돋는다. 김득신이 보았다던 연기 피어오르는 죽리의 주막집이나 뚝배기 담북장에 막걸리 사발 놓인 율리의 식당이나 다 한 가지 아닐까?
주막집 굴뚝 연기에서 아득한 외로움을 읽은 김득신의 마음으로 좌구산자연휴양림에 도착했다. 하늘을 뒤덮은 진득한 구름과 공중을 장악한 희뿌연 미세먼지는 주둔군처럼 완강하게 산을 감싸고 있었다. 휴양림 시설과 숲을 연결하는 길은 여러 갈래여서 어디부터 걷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낼지 정해야 했다. 안내판에 그려진 간략한 지도에서 걸어야 할 길을 정하고 숲길로 들어갔다. 좌구산천문대 부근에 ‘바람소리길’을 알리는 아치형 문이 있다. 숲길은 호젓했다. 좌구산 중턱 쯤 될까? 산비탈에 난 숲길을 걷는 것이다. 흙길 중간중간에 데크길을 만들었다. 둘이 어깨동무하고 걸어도 될 만한 길도 있고 혼자 걸어야하는 좁은 길도 있다. 길 옆 산비탈에 갈잎이 수북하다. 산비탈에 나무들이 촘촘하다. 길은 그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진다. 보고 있으면 걷고 싶어지는 길이다.

낙엽의 소리 바람의 노래
중간에 휴양림 시설로 내려가는 길이 갈라지지만 가던 방향으로 계속 걷는다. 얼기설기 얽힌 나뭇가지 사이로 숲 밖의 길이 보인다. 구불거리며 이어지는 길이 온기 있는 생명 같다. 전망대에 도착했다. 미세먼지 때문에 먼 풍경이 흐리다. 멀리 있는 산등성이 금이 흐릿하게 지워졌다. 상쾌하게 펼쳐진 풍경도 좋지만 간혹 이런 풍경도 괜찮겠다 싶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점점 옅어지다가 여백으로 남는 풍경, 공중으로 스미는 풍경의 끝은 사람의 마음으로 이어진다. 이야기하지 않는 말이 더 깊게 사람의 마음을 울리듯...
전망대에서 내려서서 임도를 만나 오른쪽으로 돌아 걷는다. 좌구산썰매장 앞을 지나 내리막길을 내려가면 좌구산천문대 쪽으로 올라가는 포장도로가 나온다. 도로를 따라 계속 올라간다. 별무리하우스 앞을 지나 천문대 쪽으로 더 올라가다보면 길 오른쪽에 거북전망대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나온다. 이정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걷는다. 포장된 도로를 걷다가 다시 숲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넓은 숲길에 갈잎이 수북하게 쌓였다. 갈잎을 밟으면 갈잎의 소리가 난다. 신발을 감싸는 갈잎이 어느 새 바짓단에 붙었는지 길을 함께 걷고 있었다. 산비탈에 빼곡한 나무들이 빈 가지를 서로서로 엮어 겨울을 나고 있다.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에서 나무들의 노래가 들린다. 거북전망대에서 보는 풍경도 미세먼지에 갇혔다. 반대편 산비탈에 지나온 길이 희미하게 보인다. 도착지점인 명상구름다리가 저 아래 골짜기를 저 혼자 건너고 있다. 첩첩 산줄기가 멀어질수록 희미해진다. 아득한 풍경에 박힌 마음은 시인 백석의 문장처럼 외롭고 높고 쓸쓸한데, 지나 온 겨울 숲 오솔길에서 말라 부서지는 갈잎의 소리, 다 내준 빈 가지마저 바람에 맡겨 공명하는 나무들의 노래 소리는 문장 밖 행간에서 더 깊게 울리는데...
‘죽리에 피어나는 외로운 연기’를 생각하며
남북으로 길게 뻗은 증평군의 맨 남쪽에 좌구산이 자리 잡았다. 좌구산은 증평군 괴산군 청주시의 경계를 이룬다. 산의 형국이 거북이를 닮았다고 해서 거북 구(龜)자를 넣은, 좌구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좌구산 자락에는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끝내 자신의 뜻을 이룬 조선시대 후기 시인 김득신의 무덤이 있다. 증평에서 태어난 김득신은 어릴 때 앓은 병 때문에 책을 읽어도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 등 공부와 독서에 집중하기 어려운 처지였으나, 의지와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39살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었고 59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과거 급제와 벼슬 보다 그는 시인으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으로 더 알려졌다. 다른 이들은 관직에서 물러날 나이에 관직에 나아갔으니, 그가 책을 읽고 시를 썼던 것은 입신양명의 뜻 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고 수신하려는 다짐이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은 독서에 관한 그의 일화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김득신은 <백이전>을 좋아해서 11만3천번을 읽었다고 하고 1만 번 이상 읽은 책이 36편이었다고 전한다. 다산 정약용은 그를 두고 ‘문자가 만들어진 이래 종횡으로 수천 년과 3만 리를 다 뒤져도 김득신만한 독서가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저물녘 난간에 기댄 늙은이/아득한 들녘 흥취에 끌리네/성긴 수풀에 지는 해 비꼈는데/쓸쓸한 주막엔 외로운 연기 피어오르네] -김득신 시비에 새겨진 시 <죽리의 외로운 연기>-
김득신은 죽리 주막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았을 것이다. 81세에 세상을 떠났으니, ‘저물녘 난간에 기댄 늙은이’는 김득신 자신이었겠지. 늙은 김득신의 눈에 든 풍경은 해질녘 들녘과 성긴 수풀, 그 아득함에 푹 빠진 늙은 마음은 결국 허공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주막집 굴뚝 연기와 같았으리라.
‘좌구산도 식후경’
증평읍내에서 좌구산자연휴양림으로 가는 길, 죽리를 지나면 김득신의 무덤이 있는 율리다. 율리, 우리말로 옮기면 ‘밤마을’ 정도 되겠다. 그 이름이 더 정답다. 좌구산자연휴양림 숲길을 크게 한 바퀴 돌아보는 일정이어서 좀 이르지만 점심을 먼저 먹기로 했다. ‘밤마을’에 있는 식당에서 구수한 담북장(청국장의 다른 말이다. 차림표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 청국장 보다는 담북장이라고 해야 그 맛이 더 사는 느낌이다.)에 밥 한 술 뜬다. 막걸리 한 사발로 목을 축이고 입맛을 돋운다. 어린 시절 질화로 위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던 고향집 담북장은 겨울이라서 더 맛있었다. 뚝배기 담북장과 막걸리에 추억이 돋는다. 김득신이 보았다던 연기 피어오르는 죽리의 주막집이나 뚝배기 담북장에 막걸리 사발 놓인 율리의 식당이나 다 한 가지 아닐까?
주막집 굴뚝 연기에서 아득한 외로움을 읽은 김득신의 마음으로 좌구산자연휴양림에 도착했다. 하늘을 뒤덮은 진득한 구름과 공중을 장악한 희뿌연 미세먼지는 주둔군처럼 완강하게 산을 감싸고 있었다. 휴양림 시설과 숲을 연결하는 길은 여러 갈래여서 어디부터 걷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낼지 정해야 했다. 안내판에 그려진 간략한 지도에서 걸어야 할 길을 정하고 숲길로 들어갔다. 좌구산천문대 부근에 ‘바람소리길’을 알리는 아치형 문이 있다. 숲길은 호젓했다. 좌구산 중턱 쯤 될까? 산비탈에 난 숲길을 걷는 것이다. 흙길 중간중간에 데크길을 만들었다. 둘이 어깨동무하고 걸어도 될 만한 길도 있고 혼자 걸어야하는 좁은 길도 있다. 길 옆 산비탈에 갈잎이 수북하다. 산비탈에 나무들이 촘촘하다. 길은 그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진다. 보고 있으면 걷고 싶어지는 길이다.

낙엽의 소리 바람의 노래
중간에 휴양림 시설로 내려가는 길이 갈라지지만 가던 방향으로 계속 걷는다. 얼기설기 얽힌 나뭇가지 사이로 숲 밖의 길이 보인다. 구불거리며 이어지는 길이 온기 있는 생명 같다. 전망대에 도착했다. 미세먼지 때문에 먼 풍경이 흐리다. 멀리 있는 산등성이 금이 흐릿하게 지워졌다. 상쾌하게 펼쳐진 풍경도 좋지만 간혹 이런 풍경도 괜찮겠다 싶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점점 옅어지다가 여백으로 남는 풍경, 공중으로 스미는 풍경의 끝은 사람의 마음으로 이어진다. 이야기하지 않는 말이 더 깊게 사람의 마음을 울리듯...
전망대에서 내려서서 임도를 만나 오른쪽으로 돌아 걷는다. 좌구산썰매장 앞을 지나 내리막길을 내려가면 좌구산천문대 쪽으로 올라가는 포장도로가 나온다. 도로를 따라 계속 올라간다. 별무리하우스 앞을 지나 천문대 쪽으로 더 올라가다보면 길 오른쪽에 거북전망대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나온다. 이정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걷는다. 포장된 도로를 걷다가 다시 숲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넓은 숲길에 갈잎이 수북하게 쌓였다. 갈잎을 밟으면 갈잎의 소리가 난다. 신발을 감싸는 갈잎이 어느 새 바짓단에 붙었는지 길을 함께 걷고 있었다. 산비탈에 빼곡한 나무들이 빈 가지를 서로서로 엮어 겨울을 나고 있다.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에서 나무들의 노래가 들린다. 거북전망대에서 보는 풍경도 미세먼지에 갇혔다. 반대편 산비탈에 지나온 길이 희미하게 보인다. 도착지점인 명상구름다리가 저 아래 골짜기를 저 혼자 건너고 있다. 첩첩 산줄기가 멀어질수록 희미해진다. 아득한 풍경에 박힌 마음은 시인 백석의 문장처럼 외롭고 높고 쓸쓸한데, 지나 온 겨울 숲 오솔길에서 말라 부서지는 갈잎의 소리, 다 내준 빈 가지마저 바람에 맡겨 공명하는 나무들의 노래 소리는 문장 밖 행간에서 더 깊게 울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