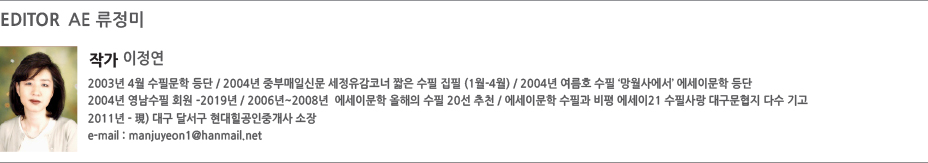커뮤니티

고무신
2020-06-24
문화
 문화놀이터
문화놀이터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고무신
'글. 이정연'
어머님께 다니러 갔더니 현관에 보랏빛 고무신 한 켤레를 씻어 비스듬히 기대 놓았다. 조가비처럼 작고 예쁜 고무신이 하도 정다워서 가방만 내려놓고 한 번 신어보니 내 발에 꼭 맞았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당신 신발을 신고 마당을 아장아장 걸어 보는 게 보기 좋은지 함박웃음을 머금고 내려다보시다가
"어째 네 발에도 꼭 맞네, 그래도 밭에 갈 때는 고무신이 최고지 흙도 안 달라붙고......." 하시며 묻지도 않은 말씀을 하신다. 발을 감싼 압박감이 학교 다녀오면 어머니가 " 에구 우리 강아지 힘들었다." 그러면서 발을 꼭 감싸주실 때 느낌처럼 좋았다.
초등학교 시절 나는 운동화를 신었던 기억이 없다. 운동화는 고사하고 고무신이라도 제때 사주면 운이 좋은 거였다. 늘 마루 밑에 던져둔 언니의 작아진 신발이나 한쪽 귀퉁이가 찢어져 꿰맨 고무신이 내 차지가 되곤 했다. 어느 해 여름방학 나는 빨래하러 가시는 어머니를 따라 시냇가로 나갔다. 장마 끝이라 냇물은 시내를 그득하게 메우며 흐르고 냇가의 너럭바위들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이 씻겨 있었다. 개울물 소리 매미 소리, 장마라 미루어 두었던 큰 빨래를 두드리는 어머니의 방망이 소리까지 한데 어울려 여름 오후의 냇가는 온통 소란스러웠다. 그 소란 속을 나는 송사리처럼 물을 차고 뛰며 놀고 있었다. 그때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 번개같이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무명실로 꿰맨 오른쪽 신발 대신 아직 멀쩡한 왼쪽 신발에서 뒤꿈치를 살짝 빼내자 물살이 기다렸다는 듯 냉큼 고무신을 벗겨 가 버렸다. 저만치 떠내려가기를 기다려
“엄마 내 신발!” 소리쳤다. 그래도 어머니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물소리 때문에 못 들으신 줄 알고 맨발을 어머니 코앞에 내밀며 짐짓 울상을 지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더욱더 세차게 방망이질만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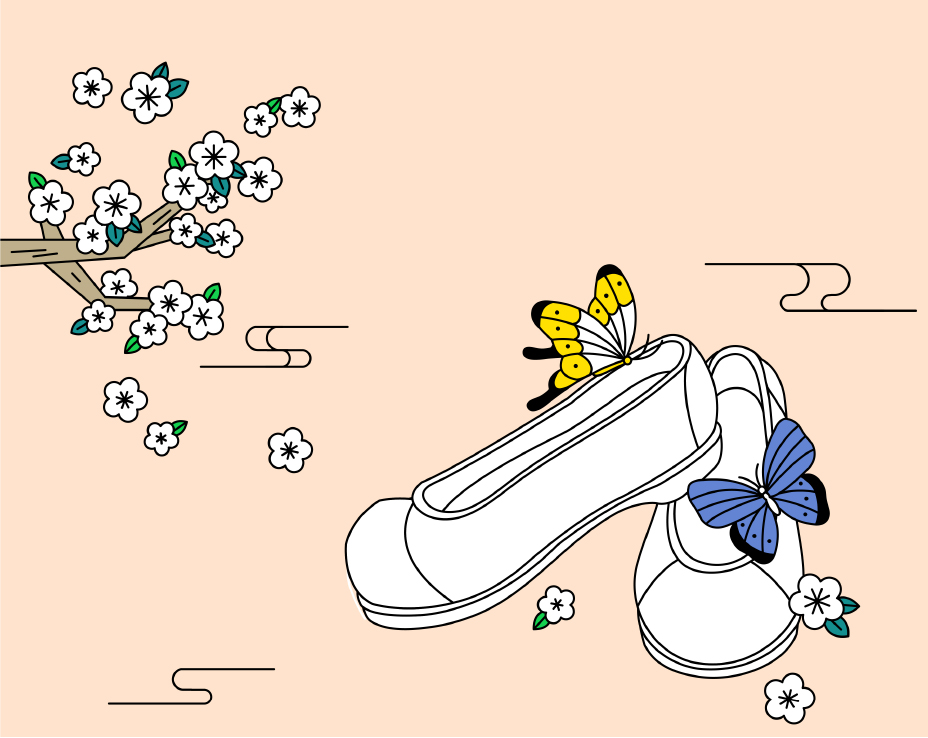
나는 그때 근 한 달째 새 신발을 사달라고 조르고 있었다. “다음 장날에 사 주마.” 다음 장날이 되니까 어머니는 “콩밭에 열무 뽑으면 사 주마.”하고 미루셨다. 어머니가 열무를 이고 장에 가신 날 나는 늦도록 어머니를 기다리다 지쳐 동구 밖까지 마중 나갔다. 이윽고 당산나무 아래로 장에 가신 다른 어른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머니가 작은 보퉁이를 이고 오셨다. ‘저 보퉁이 속에 내 고무신이 들었을 거야.’ 어머니 치마꼬리를 잡고 돌아오는 길 어쩐지 보퉁이에서 고무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나는 자꾸 코를 벌름거렸다. 그러나 집에 도착해서 펼쳐 본 보퉁이에서 나온 건 할머니께 드릴 풍년초 두 봉지와 호미 한 가락 그리고 소금에 절어 퀴퀴한 고등어 한 손이 전부였다.
가끔 친구들도 그런 짓을 저질렀다. 아직 신을 만한 신발을 거친 돌에 문질러 일부러 찢어 놓아 혼이 나기도 하였는데 그에 비하면 내 계획은 얄밉도록 완전했다. 음모는 완벽한 성공이었다. 이제야말로 어머니는 새 신을 사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방학이 끝나면 새 신을 신고 학교에 갈 수 있겠구나! 기뻐서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그러나 그 행복한 기대는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끝이 났다. 물이 줄자 어머니는 냇물을 따라 내려가 아랫동네 어귀 냇가에서 새것처럼 깨끗이 씻긴 내 고무신을 찾아오셨기 때문이었다.
여름방학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님과 어머님과 은해사 계곡에 놀러 간 일이 있었다. 그때 아이가 물 미끄럼틀처럼 생긴 바위에서 놀다가 샌들 한 짝을 떠내려 보낸 적이 있었다. 아이가 신발이 떠내려 가버렸다고 울면서 왔다. 모두 슬리퍼라도 하나 사야 집에 갈 수 있겠다고 했을 때 나는 그때의 어머니처럼 빙그레 웃으며 계곡 아래로 내려갔다. 소를 지난 물은 넓은 계곡을 만나 퍼지며 계곡에 깔린 자갈돌의 굴곡을 따라 천천히 흐르고 그 어디쯤 아이의 샌들 한 짝이 걸려 있었다.
사실 내게도 기억하지만 못할 뿐 운동화 한두 켤레쯤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발에 운동화가 신겨있던 걸 본 기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고무신처럼 편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하굣길에 입술이 파래지도록 멱을 감고 너럭바위에 씻어 엎어놓은 고무신을 신으면 따뜻하고 보송보송해서 참 기분이 좋았다. 때로는 고무신 뒤를 홀랑 뒤집어 슬리퍼처럼 신기도 하고 벗어서 다슬기나 송사리를 잡아넣고 놀면 친구가 없는 여름 방학도 그리 심심하지 않았다.
간혹 아이들이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나는 돈이 있어도 일부러 뜸을 좀 들인 후에 사준다. 사소한 물건이라도 간절히 원하다 소유하면 그 가치가 다르게 느껴진다. 여름방학이 끝나갈 즈음 내게도 새 고무신이 생겼다. 어느 날 아침 낫을 벼리러 가신다는 아버지께서 볏짚으로 내 발 크기를 재 가신 것이다. 모르긴 해도 어머니가 어처구니없는 냇가의 음모를 밤에 아버지께 몰래 말씀드렸을 것이다. 헌 고무신은 집에서 신고 그 새 고무신은 개학하면 신으려고 윗목 구석에 얌전히 놓아두었다. 잠들기 전에 고무신을 한 번 쳐다보고 나면 틀림없이 들로 산으로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고무신이 있나 없나 그것부터 살피고 아무도 없는 날은 신고 방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벗어 두고 하면서 개학날을 기다렸다. 이윽고 개학날이 되었다. 아무도 내 고무신을 주목하진 않았지만 나는 종일 내 발만 내려다보았다. 하굣길 새 고무신이 내 뒤꿈치를 살짝 깨물어 놓긴 했지만, 그해 여름만 생각하면 지금도 행복하다.
고무신 하나로도 그렇게 행복한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온갖 비싼 것을 다 가지고도 그때처럼 행복하지 않다. 동심을 잃어버려 그런 것일까. 갖고 싶었던 것을 다 가지고 나니 가슴 속 행복한 마음 샘의 물도 말라버린 것인가. 어머니의 고무신을 벗어 가지런히 놓아두고 작은 신발 안에 소복소복 내 바람을 담아 본다. 고무신 한 켤레에 담겼던 행복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어째 네 발에도 꼭 맞네, 그래도 밭에 갈 때는 고무신이 최고지 흙도 안 달라붙고......." 하시며 묻지도 않은 말씀을 하신다. 발을 감싼 압박감이 학교 다녀오면 어머니가 " 에구 우리 강아지 힘들었다." 그러면서 발을 꼭 감싸주실 때 느낌처럼 좋았다.
초등학교 시절 나는 운동화를 신었던 기억이 없다. 운동화는 고사하고 고무신이라도 제때 사주면 운이 좋은 거였다. 늘 마루 밑에 던져둔 언니의 작아진 신발이나 한쪽 귀퉁이가 찢어져 꿰맨 고무신이 내 차지가 되곤 했다. 어느 해 여름방학 나는 빨래하러 가시는 어머니를 따라 시냇가로 나갔다. 장마 끝이라 냇물은 시내를 그득하게 메우며 흐르고 냇가의 너럭바위들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이 씻겨 있었다. 개울물 소리 매미 소리, 장마라 미루어 두었던 큰 빨래를 두드리는 어머니의 방망이 소리까지 한데 어울려 여름 오후의 냇가는 온통 소란스러웠다. 그 소란 속을 나는 송사리처럼 물을 차고 뛰며 놀고 있었다. 그때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 번개같이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무명실로 꿰맨 오른쪽 신발 대신 아직 멀쩡한 왼쪽 신발에서 뒤꿈치를 살짝 빼내자 물살이 기다렸다는 듯 냉큼 고무신을 벗겨 가 버렸다. 저만치 떠내려가기를 기다려
“엄마 내 신발!” 소리쳤다. 그래도 어머니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물소리 때문에 못 들으신 줄 알고 맨발을 어머니 코앞에 내밀며 짐짓 울상을 지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더욱더 세차게 방망이질만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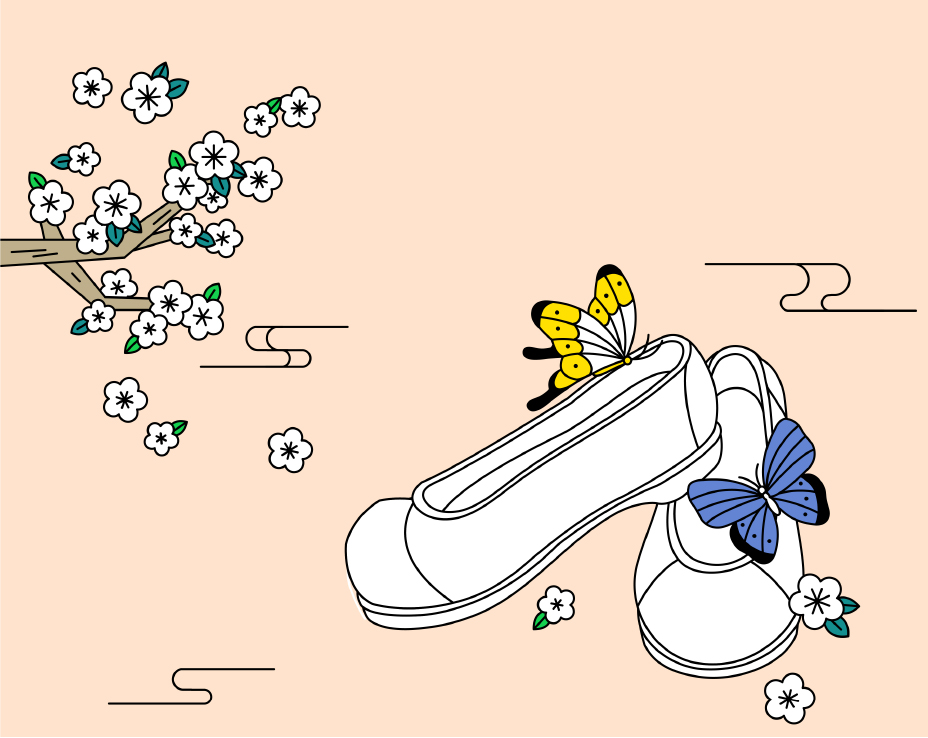
나는 그때 근 한 달째 새 신발을 사달라고 조르고 있었다. “다음 장날에 사 주마.” 다음 장날이 되니까 어머니는 “콩밭에 열무 뽑으면 사 주마.”하고 미루셨다. 어머니가 열무를 이고 장에 가신 날 나는 늦도록 어머니를 기다리다 지쳐 동구 밖까지 마중 나갔다. 이윽고 당산나무 아래로 장에 가신 다른 어른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머니가 작은 보퉁이를 이고 오셨다. ‘저 보퉁이 속에 내 고무신이 들었을 거야.’ 어머니 치마꼬리를 잡고 돌아오는 길 어쩐지 보퉁이에서 고무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나는 자꾸 코를 벌름거렸다. 그러나 집에 도착해서 펼쳐 본 보퉁이에서 나온 건 할머니께 드릴 풍년초 두 봉지와 호미 한 가락 그리고 소금에 절어 퀴퀴한 고등어 한 손이 전부였다.
가끔 친구들도 그런 짓을 저질렀다. 아직 신을 만한 신발을 거친 돌에 문질러 일부러 찢어 놓아 혼이 나기도 하였는데 그에 비하면 내 계획은 얄밉도록 완전했다. 음모는 완벽한 성공이었다. 이제야말로 어머니는 새 신을 사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방학이 끝나면 새 신을 신고 학교에 갈 수 있겠구나! 기뻐서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그러나 그 행복한 기대는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끝이 났다. 물이 줄자 어머니는 냇물을 따라 내려가 아랫동네 어귀 냇가에서 새것처럼 깨끗이 씻긴 내 고무신을 찾아오셨기 때문이었다.
여름방학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님과 어머님과 은해사 계곡에 놀러 간 일이 있었다. 그때 아이가 물 미끄럼틀처럼 생긴 바위에서 놀다가 샌들 한 짝을 떠내려 보낸 적이 있었다. 아이가 신발이 떠내려 가버렸다고 울면서 왔다. 모두 슬리퍼라도 하나 사야 집에 갈 수 있겠다고 했을 때 나는 그때의 어머니처럼 빙그레 웃으며 계곡 아래로 내려갔다. 소를 지난 물은 넓은 계곡을 만나 퍼지며 계곡에 깔린 자갈돌의 굴곡을 따라 천천히 흐르고 그 어디쯤 아이의 샌들 한 짝이 걸려 있었다.
사실 내게도 기억하지만 못할 뿐 운동화 한두 켤레쯤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발에 운동화가 신겨있던 걸 본 기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고무신처럼 편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하굣길에 입술이 파래지도록 멱을 감고 너럭바위에 씻어 엎어놓은 고무신을 신으면 따뜻하고 보송보송해서 참 기분이 좋았다. 때로는 고무신 뒤를 홀랑 뒤집어 슬리퍼처럼 신기도 하고 벗어서 다슬기나 송사리를 잡아넣고 놀면 친구가 없는 여름 방학도 그리 심심하지 않았다.
간혹 아이들이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나는 돈이 있어도 일부러 뜸을 좀 들인 후에 사준다. 사소한 물건이라도 간절히 원하다 소유하면 그 가치가 다르게 느껴진다. 여름방학이 끝나갈 즈음 내게도 새 고무신이 생겼다. 어느 날 아침 낫을 벼리러 가신다는 아버지께서 볏짚으로 내 발 크기를 재 가신 것이다. 모르긴 해도 어머니가 어처구니없는 냇가의 음모를 밤에 아버지께 몰래 말씀드렸을 것이다. 헌 고무신은 집에서 신고 그 새 고무신은 개학하면 신으려고 윗목 구석에 얌전히 놓아두었다. 잠들기 전에 고무신을 한 번 쳐다보고 나면 틀림없이 들로 산으로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고무신이 있나 없나 그것부터 살피고 아무도 없는 날은 신고 방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벗어 두고 하면서 개학날을 기다렸다. 이윽고 개학날이 되었다. 아무도 내 고무신을 주목하진 않았지만 나는 종일 내 발만 내려다보았다. 하굣길 새 고무신이 내 뒤꿈치를 살짝 깨물어 놓긴 했지만, 그해 여름만 생각하면 지금도 행복하다.
고무신 하나로도 그렇게 행복한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온갖 비싼 것을 다 가지고도 그때처럼 행복하지 않다. 동심을 잃어버려 그런 것일까. 갖고 싶었던 것을 다 가지고 나니 가슴 속 행복한 마음 샘의 물도 말라버린 것인가. 어머니의 고무신을 벗어 가지런히 놓아두고 작은 신발 안에 소복소복 내 바람을 담아 본다. 고무신 한 켤레에 담겼던 행복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