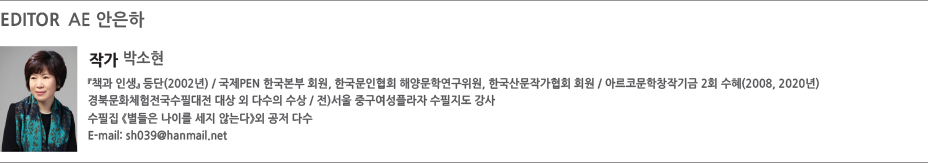커뮤니티

[수필] 유자향기
2023-06-14
문화
 문화놀이터
문화놀이터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수필] 유자향기
'글. 박소현'
추억의 귀퉁이엔 언제나 아른거리는 어린 날들이 있다. 거리엔 하나 둘 낙엽이 쌓이고 쌀쌀한 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계절이 오면 잊었던 유년의 기억들이 슬며시 화선지에 먹물 번지듯 스며온다.
역사 속 이름난 귀양지였던 남해. 간신히 죽임은 면했지만 외딴 섬으로 유배의 형을 받아 뭍을 향한 그리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 서포 김만중, 후송 류의양, 자암 김구…. 철썩이는 파도만이 섬을 지키던 유배지. 그 섬마을에 다리가 놓이고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서울에서도 4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그곳이 마음속엔 언제나 열 몇 살 때의 기억으로 머물러 있다.

삼자(유자, 치자, 비자)의 고장. 가을이면 탐스럽고 노란 유자향기 가득하던 곳, 저녁밥 짓는 연기가 굴뚝마다 피어오르던 수채화 같은 고향 마을. 같이 놀던 동무들. 어릴 때 떠났던 그곳이 차츰 가슴속에 자리 잡는 시간이 많아지는 건 나이 들었음인가?
창 밖에 찬바람 몰아치는 소리가 들리면 어린 날의 추억들과 함께 유자차를 담그는 일이 나에겐 연중행사가 되었다. 어릴 때 고향을 떠나 그 기억들이 조금씩 잊혀 갈 때쯤, 해마다 시어머님이 보내주시는 탐스러운 유자들은 처음엔 감당할 수 없는 버거움이었다. 오랜 도시 생활로 이미 나는 달콤 쌉쌀한 커피 향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만의 방법으로 유자차 만드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탐스럽게 익은 유자를 깨끗이 씻어 씨를 빼고 잘게 썰어, 가늘게 저민 대추와 밤을 함께 넣어 설탕과 버무리는 것이다. 그것을 예쁜 유리병에 담으면 노란 유자와 빨간 대추가 어우러져 색다른 맛의 유자차가 된다. 이렇게 만든 것을 화사한 포장지에 싸고 고운 리본을 묶어 가까운 이웃들에게 한 병씩 선물하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다.
유자는 운향과(云香科)에 속하는 과일로 온화한 해양성 기후에서 잘 자란다. 원산지는 중국 양자강 상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재배가 됐는지 확실한 기록이 없다. 속설에 의하면 신라 문성왕 때 장보고가 당나라 상인 집에서 선물로 받아오다 풍랑을 만나 남해에 안착할 때 도포자락 속에 있던 유자가 깨어져 그 씨앗이 남해에 전파 되었다고 한다. 몇 십 년 전만 해도 유자나무는 한 그루만 있어도 아들 한 명 거뜬히 대학을 보낼 수 있다하여 ‘대학나무’로도 불렸다. 장보고는 알고 있을까? 당신이 떨어뜨린 한 알의 유자 씨가 천년의 세월을 넘어 은은한 향기로 퍼져 나가고 있음을.

올해도 나는 유자차를 담글 것이다. 유자 향기 속에는 단발머리 나풀거리던 어린 날의 내가 보이고, 깃발을 나부끼며 부산으로 가던 페리호의 긴 고동 소리가 들린다. 내가 열 살 때, 〈섬마을 선생〉을 구성지게 잘 부르던 언니가 부산으로 시집을 갔다. 나와 11살 차이가 나는 언니는 양재학원을 다니면서 그 당시 유행하던 테트론 천으로 내 블라우스나 원피스를 자주 만들어 주곤 했다. 나는 지금도 언니가 만들어 준 옥색 블라우스와 발레복처럼 생긴 흰색 원피스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렌다.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자랑할 생각에 들떠 그 옷들을 꼭 껴안고 잠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나는 바닷가에서 파래를 뜯다가도 페리호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언니가 보고싶어 괜시리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다. 짭쪼름한 바닷바람에 유자가 여물어 가면 나는 손꼽아 겨울방학을 기다렸고, 방학하기 무섭게 엄마가 싸 준 보퉁이를 들고 부산가는 배를 탔다. 그 속엔 고구마나 간장, 된장 같은 먹거리들과 함께 꼭꼭 눌러 싼 유자차가 수줍게 들어 있었다.
밤에 온 소포 받고 문 닫지 못한다
서투른 글씨로 동여맨 겹겹의 매듭마다
주름진 손마디 한데 묶여 도착한
어머님 겨울 안부, 남쪽 섬 먼 길을
해풍도 마르지 않고 바삐 왔구나(중략)
큰 집 뒤따메 올 유자가 잘 댓다고 몃개 따서
너어 보내니 춥울 때 다려 먹거라
고생 만앗지야
봄 볕치 풀리믄 또 조흔 일도 안 잇것나.
사람이 다 지 아래를 보고 사는 거라 어렵더라도
참고 반다시 몸만 성키 추스리라
고두현 〈늦게 온 소포〉 중에서
동향의 시인이 쓴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나는 어머니를 떠올린다. 집 가까운 곳에 약국이나 병원이 없었던 시절, 감기에 잘 걸리던 우리 형제들을 위해 어머니는 곧잘 진하게 다린 유자청을 약 대신 먹이곤 했다. 목구멍이 뜨거워지도록 후후 불어 마시고 두꺼운 솜이불 을 푹 눌러 쓰고 잠든 다음날 아침이면 거짓말처럼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가을날 노랗게 떨어지던 곰솔나무 갈비만큼이나 수북하게 쌓인 내 어린 날의 기억들은 이제 한 겨울 유자향기처럼 그리움으로 남아 있다. 젊디젊었던 어머니는 이제 손녀, 손자를 수십 명 거느린 호호 할머니가 되었고 나는 그때 그 엄마보다 더 많은 나이를 먹게 되었다.
무거운 삶의 굴레를 잠시 부려 놓고 진한 유자차 한 잔으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 그리곤 유자향기처럼 은은하게 따스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역사 속 이름난 귀양지였던 남해. 간신히 죽임은 면했지만 외딴 섬으로 유배의 형을 받아 뭍을 향한 그리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곳. 서포 김만중, 후송 류의양, 자암 김구…. 철썩이는 파도만이 섬을 지키던 유배지. 그 섬마을에 다리가 놓이고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서울에서도 4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그곳이 마음속엔 언제나 열 몇 살 때의 기억으로 머물러 있다.

삼자(유자, 치자, 비자)의 고장. 가을이면 탐스럽고 노란 유자향기 가득하던 곳, 저녁밥 짓는 연기가 굴뚝마다 피어오르던 수채화 같은 고향 마을. 같이 놀던 동무들. 어릴 때 떠났던 그곳이 차츰 가슴속에 자리 잡는 시간이 많아지는 건 나이 들었음인가?
창 밖에 찬바람 몰아치는 소리가 들리면 어린 날의 추억들과 함께 유자차를 담그는 일이 나에겐 연중행사가 되었다. 어릴 때 고향을 떠나 그 기억들이 조금씩 잊혀 갈 때쯤, 해마다 시어머님이 보내주시는 탐스러운 유자들은 처음엔 감당할 수 없는 버거움이었다. 오랜 도시 생활로 이미 나는 달콤 쌉쌀한 커피 향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만의 방법으로 유자차 만드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탐스럽게 익은 유자를 깨끗이 씻어 씨를 빼고 잘게 썰어, 가늘게 저민 대추와 밤을 함께 넣어 설탕과 버무리는 것이다. 그것을 예쁜 유리병에 담으면 노란 유자와 빨간 대추가 어우러져 색다른 맛의 유자차가 된다. 이렇게 만든 것을 화사한 포장지에 싸고 고운 리본을 묶어 가까운 이웃들에게 한 병씩 선물하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다.
유자는 운향과(云香科)에 속하는 과일로 온화한 해양성 기후에서 잘 자란다. 원산지는 중국 양자강 상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재배가 됐는지 확실한 기록이 없다. 속설에 의하면 신라 문성왕 때 장보고가 당나라 상인 집에서 선물로 받아오다 풍랑을 만나 남해에 안착할 때 도포자락 속에 있던 유자가 깨어져 그 씨앗이 남해에 전파 되었다고 한다. 몇 십 년 전만 해도 유자나무는 한 그루만 있어도 아들 한 명 거뜬히 대학을 보낼 수 있다하여 ‘대학나무’로도 불렸다. 장보고는 알고 있을까? 당신이 떨어뜨린 한 알의 유자 씨가 천년의 세월을 넘어 은은한 향기로 퍼져 나가고 있음을.

올해도 나는 유자차를 담글 것이다. 유자 향기 속에는 단발머리 나풀거리던 어린 날의 내가 보이고, 깃발을 나부끼며 부산으로 가던 페리호의 긴 고동 소리가 들린다. 내가 열 살 때, 〈섬마을 선생〉을 구성지게 잘 부르던 언니가 부산으로 시집을 갔다. 나와 11살 차이가 나는 언니는 양재학원을 다니면서 그 당시 유행하던 테트론 천으로 내 블라우스나 원피스를 자주 만들어 주곤 했다. 나는 지금도 언니가 만들어 준 옥색 블라우스와 발레복처럼 생긴 흰색 원피스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렌다.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자랑할 생각에 들떠 그 옷들을 꼭 껴안고 잠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나는 바닷가에서 파래를 뜯다가도 페리호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언니가 보고싶어 괜시리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다. 짭쪼름한 바닷바람에 유자가 여물어 가면 나는 손꼽아 겨울방학을 기다렸고, 방학하기 무섭게 엄마가 싸 준 보퉁이를 들고 부산가는 배를 탔다. 그 속엔 고구마나 간장, 된장 같은 먹거리들과 함께 꼭꼭 눌러 싼 유자차가 수줍게 들어 있었다.
밤에 온 소포 받고 문 닫지 못한다
서투른 글씨로 동여맨 겹겹의 매듭마다
주름진 손마디 한데 묶여 도착한
어머님 겨울 안부, 남쪽 섬 먼 길을
해풍도 마르지 않고 바삐 왔구나(중략)
큰 집 뒤따메 올 유자가 잘 댓다고 몃개 따서
너어 보내니 춥울 때 다려 먹거라
고생 만앗지야
봄 볕치 풀리믄 또 조흔 일도 안 잇것나.
사람이 다 지 아래를 보고 사는 거라 어렵더라도
참고 반다시 몸만 성키 추스리라
고두현 〈늦게 온 소포〉 중에서
동향의 시인이 쓴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나는 어머니를 떠올린다. 집 가까운 곳에 약국이나 병원이 없었던 시절, 감기에 잘 걸리던 우리 형제들을 위해 어머니는 곧잘 진하게 다린 유자청을 약 대신 먹이곤 했다. 목구멍이 뜨거워지도록 후후 불어 마시고 두꺼운 솜이불 을 푹 눌러 쓰고 잠든 다음날 아침이면 거짓말처럼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
가을날 노랗게 떨어지던 곰솔나무 갈비만큼이나 수북하게 쌓인 내 어린 날의 기억들은 이제 한 겨울 유자향기처럼 그리움으로 남아 있다. 젊디젊었던 어머니는 이제 손녀, 손자를 수십 명 거느린 호호 할머니가 되었고 나는 그때 그 엄마보다 더 많은 나이를 먹게 되었다.
무거운 삶의 굴레를 잠시 부려 놓고 진한 유자차 한 잔으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다. 그리곤 유자향기처럼 은은하게 따스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