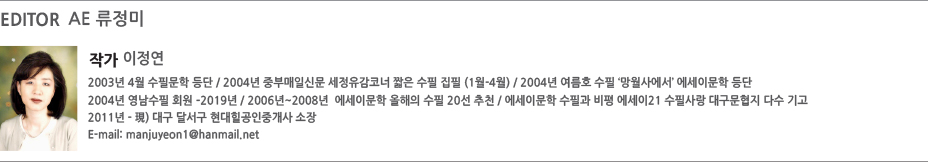커뮤니티

[수필] 그리운 겨울밤
2023-06-14
문화
 문화놀이터
문화놀이터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수필] 그리운 겨울밤
'글. 이정연'
차갑도록 파란 하늘 저 끝에 회색 구름이 일면, 구름 너머로 석양은 홀로 지쳐 타 버릴 듯 붉었다가 한눈파는 사이에 산 아래로 떨어져 버렸다. 호박죽에 동치미, 간식이나 다를 바 없는 저녁상을 막 물린 후였다. 해가 넘어가자 이따금 바람에 감나무 가지만 첼로의 현처럼 떨릴 뿐 심심산골은 캄캄하고 깊은 적막 속에 묻혔다.
어머니는 반짇고리를 당겨 앉으시고 언니는 국민교육헌장을 벌써 몇 번째 외고 있는지 몰랐다. 나는 언니를 따라 속으로 국민교육헌장을 외어보다가 그도 재미가 없어 할머니 곁으로 다가앉았다.
"할머니! 옛날이야기 해 주세요!"
"이야기 이젠 없어!"
"무학산에서 도 닦으시던 할아버지 이야기 있잖아요!"
할아버지 이야기라면 할머니는 어렵지 않게 해주셨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하실 때마다 번번이 조금씩 달라지고 보태어졌고 그러면서 당신은 스스로 더 신명이 나셨다.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새록새록 재미가 더했고 남들은 반나절도 넘게 걸린다는 무학산에서 두어 시간 만에 집에 오셨다는 할아버지는, 할머니 말씀보다 몇 배나 내게 더 자랑스러웠다. 이야기에 목이 마르면 할머니는 헛기침을 몇 번 해 두시고 긴 곰방대에 꼭꼭 눌러 풍년초를 담고 화롯불을 헤치셨다.

앞산 소나무 숲 부엉이는 밤새 울어대고, 사랑방 옆 외양간에선 송아지 딸린 암소가 배가 고픈지 요령 소리를 쩔렁거렸다. 쇠죽 솥 전에서 동그랗게 몸을 말고 잠들었던 누렁이마저, 이 겨울밤이 지루해 못 견디겠다는 듯 하품을 하며 목을 털면, 그제야 어머니는 마지못해 깁고 있던 나일론 양말을 다독다독 반짇고리에 눌러 놓고 일어나셨다. 잠들기 전에 쇠죽을 퍼주러 나가시는 것이다. 아랫목에서 구깃구깃 구겨진 어머니의 검은 무명치맛자락 사이로 차디찬 산골 바람이 와락 방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이어서 쇠죽 솥뚜껑 여는 소리가 들리고 구수한 쇠죽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들면 우린 침을 삼키며 기대를 하곤 하였다. 그다음 어머니가 하시는 일은 뒤란에 놓여있던 항아리에서 고욤을 한 양재기 퍼 오시는 게 순서였기 때문이다. 때로는 윗목 함지박의 왕겨 속에 묻어 두었던 고구마나, 큰 독 속의 감을 꺼내 주실 때도 있었지만 그건 드문 일이고 겨울밤의 주된 우리들의 간식은 고욤이었다.
놋숟가락 몇 개를 걸친 고욤 양재기가 방안으로 들이 밀어지면 할머니도 슬그머니 곰방대를 화롯전에 걸쳐두고,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던 언니도 할머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나도 오글오글 양재기 곁으로 모여들곤 하였다. 단물이 고인 고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으면 그 시린 겨울밤도 마냥 달콤하기만 하였다. 고욤은 아무리 일없는 겨울이라도 낮에 먹기에는 좀 그렇다. 조청처럼 쫄깃하게 엉겨 문드러진 과육 사이의 씨를 발라내려면 긴긴 겨울밤에 푸근하게 시간을 두고 마음 놓고 먹어야 제격이다. 고욤을 만복감이 들도록 먹을 일은 애초에 없다. 몇 숟갈 입에 가져가지 않아 다디단 과육에 혓바닥이 아릿해져 오기 때문이다.
고욤 먹던 날 밤엔 여지없이 눈이 왔다.
밖에서 들어오신 어머니의 무명치마에 희끗희끗 내려앉은 설편이 소리 없이 녹아 스며들고, 그 뻣뻣하고 차가운 기운이 좋아서 치마에 얼굴을 묻으면 볼이 시리다 못해 쓰라렸다. 거친 치마폭에선 이제 막 배어든 쇠죽 냄새, 그보다 전부터 배어 올에 스민 어머니의 땀 냄새, 맑고 시원한 산골의 눈바람 냄새가 났다. 그 냄새에 나는 차츰 철이 들어갔다. 고욤씨가 소복하게 모인 누런 포대종이를 저만치 윗목에 밀어 놓고 장판이 시커멓게 눌어붙은 아랫목에 누우면 일곱 살 계집아이는 말똥말똥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언제 커서 학교에 가게 되나, 또 언제 졸업을 하고 공장에 가서, 이웃집 언니처럼 베갯잇같이 짧은 치마에 굽 높은 구두를 신게 되나 기다렸다. 또 설날엔 몇 개 꾸러미 선물상자를 안고 동구를 자랑스럽게 걸어오는 나를 생각하고 천장에다 갖가지 그림을 그리느라, 긴긴 겨울밤은 도무지 깊어지지 않았다.
만족하게 쇠죽을 먹은 소의 요령 소리가 벽을 타고 평화롭게 들려 왔다. 할머니는 소가 되새김질하며 규칙적으로 내는 요령 소리를 참 듣기 좋아하셨다. 토실토실한 송아지를 달고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가 외양간에 안전하게 매여 있음이 흐뭇하게 확인되기도 하는 까닭이었다. 심심산골에서 누가 마음먹고 소를 훔쳐 가는 일은 없었지만, 간혹 먼 친척들이 노름빚을 갚느라 밤에 몰래 소를 몰고 가버리는 일도 있었기 때문이다. 발각되어도 설마 나를 어쩌겠느냐 하는 믿는 정이 있던 때였다.
언제고 다시 그런 겨울밤을 맞아 볼 날이 있을까!
설사 먼 훗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본다고 해도 누가 내게 고욤을 퍼다 주실까. 누가 내게 입이 마르도록 쌀 한 줌으로 열흘을 나신 할아버지 이야기를 지치지도 않고 들려주실까. 입동(立冬)이 보름도 더 지났지만 내게 더는 겨울밤이 없다. 뽀드득 뽀드득 눈 쌓인 마당의 푸른 달빛을 밟고 오줌 누러 가던 오싹한 겨울밤을 앞 뒤 아파트 숲에 갇혀 그리움에 사무친다.
어머니는 반짇고리를 당겨 앉으시고 언니는 국민교육헌장을 벌써 몇 번째 외고 있는지 몰랐다. 나는 언니를 따라 속으로 국민교육헌장을 외어보다가 그도 재미가 없어 할머니 곁으로 다가앉았다.
"할머니! 옛날이야기 해 주세요!"
"이야기 이젠 없어!"
"무학산에서 도 닦으시던 할아버지 이야기 있잖아요!"
할아버지 이야기라면 할머니는 어렵지 않게 해주셨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하실 때마다 번번이 조금씩 달라지고 보태어졌고 그러면서 당신은 스스로 더 신명이 나셨다.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새록새록 재미가 더했고 남들은 반나절도 넘게 걸린다는 무학산에서 두어 시간 만에 집에 오셨다는 할아버지는, 할머니 말씀보다 몇 배나 내게 더 자랑스러웠다. 이야기에 목이 마르면 할머니는 헛기침을 몇 번 해 두시고 긴 곰방대에 꼭꼭 눌러 풍년초를 담고 화롯불을 헤치셨다.

앞산 소나무 숲 부엉이는 밤새 울어대고, 사랑방 옆 외양간에선 송아지 딸린 암소가 배가 고픈지 요령 소리를 쩔렁거렸다. 쇠죽 솥 전에서 동그랗게 몸을 말고 잠들었던 누렁이마저, 이 겨울밤이 지루해 못 견디겠다는 듯 하품을 하며 목을 털면, 그제야 어머니는 마지못해 깁고 있던 나일론 양말을 다독다독 반짇고리에 눌러 놓고 일어나셨다. 잠들기 전에 쇠죽을 퍼주러 나가시는 것이다. 아랫목에서 구깃구깃 구겨진 어머니의 검은 무명치맛자락 사이로 차디찬 산골 바람이 와락 방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이어서 쇠죽 솥뚜껑 여는 소리가 들리고 구수한 쇠죽 냄새가 문틈으로 새어들면 우린 침을 삼키며 기대를 하곤 하였다. 그다음 어머니가 하시는 일은 뒤란에 놓여있던 항아리에서 고욤을 한 양재기 퍼 오시는 게 순서였기 때문이다. 때로는 윗목 함지박의 왕겨 속에 묻어 두었던 고구마나, 큰 독 속의 감을 꺼내 주실 때도 있었지만 그건 드문 일이고 겨울밤의 주된 우리들의 간식은 고욤이었다.
놋숟가락 몇 개를 걸친 고욤 양재기가 방안으로 들이 밀어지면 할머니도 슬그머니 곰방대를 화롯전에 걸쳐두고,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던 언니도 할머니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나도 오글오글 양재기 곁으로 모여들곤 하였다. 단물이 고인 고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으면 그 시린 겨울밤도 마냥 달콤하기만 하였다. 고욤은 아무리 일없는 겨울이라도 낮에 먹기에는 좀 그렇다. 조청처럼 쫄깃하게 엉겨 문드러진 과육 사이의 씨를 발라내려면 긴긴 겨울밤에 푸근하게 시간을 두고 마음 놓고 먹어야 제격이다. 고욤을 만복감이 들도록 먹을 일은 애초에 없다. 몇 숟갈 입에 가져가지 않아 다디단 과육에 혓바닥이 아릿해져 오기 때문이다.
고욤 먹던 날 밤엔 여지없이 눈이 왔다.
밖에서 들어오신 어머니의 무명치마에 희끗희끗 내려앉은 설편이 소리 없이 녹아 스며들고, 그 뻣뻣하고 차가운 기운이 좋아서 치마에 얼굴을 묻으면 볼이 시리다 못해 쓰라렸다. 거친 치마폭에선 이제 막 배어든 쇠죽 냄새, 그보다 전부터 배어 올에 스민 어머니의 땀 냄새, 맑고 시원한 산골의 눈바람 냄새가 났다. 그 냄새에 나는 차츰 철이 들어갔다. 고욤씨가 소복하게 모인 누런 포대종이를 저만치 윗목에 밀어 놓고 장판이 시커멓게 눌어붙은 아랫목에 누우면 일곱 살 계집아이는 말똥말똥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언제 커서 학교에 가게 되나, 또 언제 졸업을 하고 공장에 가서, 이웃집 언니처럼 베갯잇같이 짧은 치마에 굽 높은 구두를 신게 되나 기다렸다. 또 설날엔 몇 개 꾸러미 선물상자를 안고 동구를 자랑스럽게 걸어오는 나를 생각하고 천장에다 갖가지 그림을 그리느라, 긴긴 겨울밤은 도무지 깊어지지 않았다.
만족하게 쇠죽을 먹은 소의 요령 소리가 벽을 타고 평화롭게 들려 왔다. 할머니는 소가 되새김질하며 규칙적으로 내는 요령 소리를 참 듣기 좋아하셨다. 토실토실한 송아지를 달고 있어서이기도 했지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가 외양간에 안전하게 매여 있음이 흐뭇하게 확인되기도 하는 까닭이었다. 심심산골에서 누가 마음먹고 소를 훔쳐 가는 일은 없었지만, 간혹 먼 친척들이 노름빚을 갚느라 밤에 몰래 소를 몰고 가버리는 일도 있었기 때문이다. 발각되어도 설마 나를 어쩌겠느냐 하는 믿는 정이 있던 때였다.
언제고 다시 그런 겨울밤을 맞아 볼 날이 있을까!
설사 먼 훗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본다고 해도 누가 내게 고욤을 퍼다 주실까. 누가 내게 입이 마르도록 쌀 한 줌으로 열흘을 나신 할아버지 이야기를 지치지도 않고 들려주실까. 입동(立冬)이 보름도 더 지났지만 내게 더는 겨울밤이 없다. 뽀드득 뽀드득 눈 쌓인 마당의 푸른 달빛을 밟고 오줌 누러 가던 오싹한 겨울밤을 앞 뒤 아파트 숲에 갇혀 그리움에 사무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