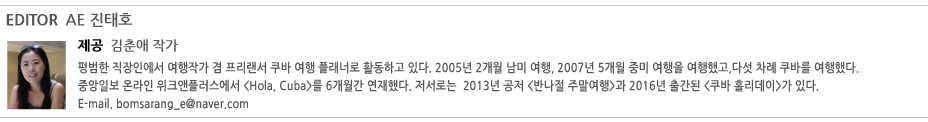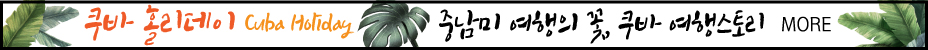커뮤니티

또 다른 풍경의 쿠바
2018-03-14
라이프가이드
 여행
여행
또 다른 풍경의 쿠바
''


비냘레스(Vinales)는 녹색의 도시다. 온통 푸르다. 산도, 들도 그리고 바람도 푸르다. 자연 그대로의 쿠바를 만나고 싶다면 이곳엘 가야 한다. 비냘레스 여행의 키워드는 ‘자연’과 ‘힐링’이다. 특히 내겐 그랬다. 고향에 온 것처럼 포근하고 아늑했다. 시골의 아침을 깨우는 건 늘 새의 몫이다. 재잘재잘 시끄럽게 짖어대는 새소리에 깨 문을 열면 소달구지 끌고 일터로 향하는 농부가 있고, 자전거 끌고 이른 여행을 시작하는 여행자가 있다. 작은 수레에 파인애플을 파는 총각이 있고 눈을 뜰 수 없게 내게 다가오는 아침 햇살이 있다. 내 고향의 아침도 그랬다. 아버지는 지게에 쟁기를 얹고 소를 몰아 밭으로 나갔다. 문을 열면 아침 해를 받은 거름 자리에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곤 했었다. 비냘레스는 내게 고향 같은 곳이었다.


쿠바의 평온한 시골 풍경

한참을 달린 자동차가 도심을 벗어나자 길은 좁아진다.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할 때마다 풍경도 달라진다.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곧 도착할 듯하면서 제법 오래 걸렸다. 푸른색 나무 사이로 듬성듬성 회색의 바위가 모습을 드러냈다. 온통 석회암이다. 세월의 흐름대로 그 형태는 제각각이다. 소나기가 비를 한차례 퍼붓고 지나가자 선명하게 단장한 비냘레스가 나타났다, 비가 그치자 길을 가던 여행자들은 다시 자전거 페달을 밟았고 자동차는 그들의 흐름에 맞춰 서두르지 않고 지나간다. 비냘레스는 아바나에서 서북쪽으로 약 150km, 차로는 4시간 거리다. 왕복 4차선의 도로가 마을을 가로지르고 도로를 중심으로 가게와 까사(민박집)가 늘어서 있다. 붉은 지붕에 알록달록 색을 칠한 집은 어쩜 그리 똑같은지. 문패와 번지수가 없다면 찾지도 못할 판이다. 시내를 둘러보는 건 반나절이면 충분하다. 비냘레스는 시가의 재료인 담뱃잎 재배지로 유명하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시가는 쿠바에서도 인정받은 품질 좋은 시가다. 마침 밭에선 어린 담뱃잎이 마음껏 햇살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다.

1. 비냘레스 시가지의 풍경 2. 비냘레스에서 흔히 보는 소달구지와 농부 3. 라 에미미다(Hotel La Ermita) 전망대의 오후 풍경 4. 비냘레스 라 꾸까(La Cuenca)레스토랑의 내부 5. 현대식의 세련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3J 따빠스(3J Tapas)

비와 바람과 햇살이 만든 곳

비냘레스 마을이 있는 비냘레스 계곡은 쿠바 정부가 지정한 ‘국가 기념물’이자 국립공원이다. 같은 해 1999년 유네스코는 비냘레스 계곡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다.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 이유다. 비냘레스는 모고테(Mogote)라 부르는 독특한 모양의 언덕이 유명하다. 모고테는 오래되지 않은 석회암 덩어리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용식작용에 의해 생긴 독특한 지형이다. 그 모양이 제주의 오름과 흡사하다. 몽실몽실 만들어진 언덕이 자세히 보면 석회암으로 날카롭게 깎여있다. 혹은 세월에 씻겨 신기한 모양을 만들기도 했다. 전망대에 오르면 붉은 흙, 쭉쭉 뻗은 야자수 그리고 모고테가 만드는 풍경은 그림 같다. 석회암 동굴탐험, 암벽 등반, 카노페(Canope)라 부르는 짚라인(Zipline) 등 자연에서 즐기는 엑티비티도 다양하다. 5페소(약 6천원)면 온종일 타고 내리기를 반복할 수 있는 미니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종일 마을을 돌았다. 딱히 둘러볼 박물관도 없고 꼭 들려야 할 특별한 곳도 없지만 비냘레스에선 행복하다. 자연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

비냘레스에도 변화의 바람이

현대식으로 꾸며진 내부 인테리어, 세련된 플레이팅, 젊고 잘생긴 웨이터의 쿠바답지 않은 서비스. 비냘레스가 변하고 있다. 앉아 있노라면 이곳이 정말 쿠바인가 하는 곳이 제법 늘었다. 외국인들의 입맛과 취향에 맞춘 레스토랑과 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거리풍경은 조금씩 바뀌고 있다. 블랙 앤 화이트로 꾸며진 레스토랑 라 꾸엔카(La Cuenca)는 오픈 주방에 젊고 잘생긴 바텐더가 있었다. 아바나 클럽 럼이 들어간 칵테일을 석 잔이나 마셨다. 톡 쏘고 달콤하고 상큼하고 싸한 그 맛은 쿠바의 것 그대로였다. 언젠가 이 거리가 모두 변해 내가 사는 곳과 다를 바 없어진대도 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도 그들이 누리고 싶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으니까. 여행자의 이기심으로, 그들만은 그들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건 너무 잔인하다. 그래도 한 가지, 비냘레스 담뱃잎으로 만든 시가의 맛은 변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