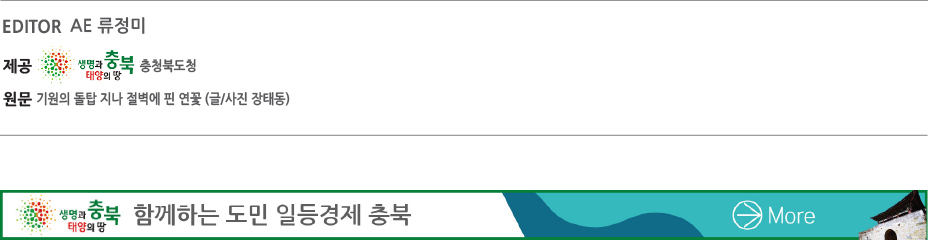커뮤니티

기원의 돌탑 지나 절벽에 핀 연꽃
2019-09-10
라이프가이드
 여행
여행
충북 어디까지 가봤니
기원의 돌탑 지나 절벽에 핀 연꽃
'제천 정방사길'
능강 9경, 능강계곡 아홉 가지 빼어난 경치 중 하나가 용주폭이다. 너럭바위 계곡에 부서지는 물줄기, 진주 같은 물방울이 튀어오르는 모습에 옛 사람들은 용주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능강교 아래 너럭바위 골을 타고 흐르는 용주폭을 보고 정방사로 향한다. 2.5㎞ 오르막길, 길가에 쌓인 크고 작은 기원의 돌탑을 지나 절벽에 둥지를 튼 정방사를 만난다. 절 마당에서 망망한 산줄기의 바다를 굽어본다. 겹겹이 겹친 산줄기가 밀려오거나 또 그렇게 밀려가는 물결을 닮았다. 그 품에 안긴 청풍호는 안식처럼 평온하다. 격랑과 평온을 넘나드는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으니, 정방사 마당 앞에 펼쳐진 풍경에 마음을 던져본다.
청풍호 자드락길 2코스의 시작 능강계곡
자드락길이란 나지막한 산기슭의 비탈진 땅에 난 좁은 길이란 뜻이다. 자드락길은 1코스부터 7코스까지 있는 데 각각 길의 특징이 있어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중 능강교에서 정방사까지 이어지는 길이 ‘청풍호 자드락길 2코스 정방사길’이다.

정방사길은 2.5㎞ 정도 된다. 정방사로 올라갔던 길로 다시 돌아와야 하니 왕복 5㎞를 걸어야 하는 셈이다.
그길 시작 지점인 능강계곡은 조선시대부터 경치 좋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옛 사람들은 능강계곡에서 아름다운 아홉 가지 풍경을 골라 이름을 붙였다. 쌍벽담, 몽유담, 와운폭, 관주폭, 용주폭, 금병대, 연자탑, 만당암, 취적대가 그것이다.
그중 쌍벽담, 몽유담, 와운폭, 관주폭은 충주댐이 생기면서 물에 잠겼다. 그리고 다섯 번째 풍경인 용주폭도 온전한 옛 모습을 잃고 그 일부만 남았다.
너럭바위 위로 흐르는 계곡 물줄기가 부서지며 진주 같은 물방울이 튀어 오르는 풍경을 보고 옛 사람들이 용주폭이라고 했다. 지금 남아있는 용주폭의 길이가 20~30m이고 그 아래 물줄기가 고였다 흐르는 곳까지 치면 규모가 엄청나다. 게다가 충주댐이 생기면서 물에 잠긴 곳까지 치면 옛 사람들은 지금보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을 것이다.
능강교 아래 작은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맑은 웅덩이에 고였다 너럭바위 위로 미끄러지듯 흐른다.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너럭바위에 앉아 물이 흘러가는 쪽을 바라본다. 풍경이 익숙해질 무렵 자리를 털고 일어나 능강교로 올라가 정방사길을 걷기 시작한다.

누군가의 기원을 담은 돌탑들
능강교에서 출발한 걸음을 이내 멈춘다. 계곡을 건너는 다리 양쪽에 펼쳐진 풍경을 카메라에 담는다. 소나무 뿌리가 드러난 커다란 바위 아래로 푸른 물줄기가 흐른다. 물결마다 산란하는 햇볕이 물비늘을 만든다. 그 위 계곡에 크고 작은 돌멩이와 바위가 엉켜있다. 그 사이로 물이 고이고 흐른다. 계곡 기슭 커다란 바위에 작은 돌탑이 보인다. 계곡에 나뒹구는 돌멩이가 누군가의 기원을 품고 작은 돌탑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오르막 시멘트 길을 걷는다. 부드러운 흙길이었으면 걷는 마음이 더 편했을 텐데, 다만 그늘을 만드는 숲이 보호막이 되어 걷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줄 뿐이다.
올라갈수록 계곡은 도랑처럼 좁아지고 물은 말랐다. 사실 정방사로 오르는 길 옆 작은 계곡은 능강계곡의 본류가 아니다. 계곡의 본류는 조금 전 다리 위에서 보았던 푸른 물줄기 반짝이는 물비늘, 그 물줄기를 거슬러가는 물길이다. 상류로 올라가다보면 능강9경의 금병대, 연자탑, 만당암, 취적대가 나온다.
정방사로 올라가는 길은 능강9경 이름 붙은 풍경을 찾아가는 길은 아니기에, 팍팍한 다리 느린 걸음으로 조금씩 정방사를 향해 갈 뿐이다.
바람이 숲을 통째로 흔든다. 커다란 나무가 흥청흥청 흔들리고, 흔들리는 잔가지에서 서걱대는 소리가 난다. 위태롭게 세워진 돌탑이 그 바람에 금세 무너질 것 같다. 돌탑은 성황당 돌무지처럼 몸집이 비대하지 않다. 돌 몇 개가 쌓여 간신히 버티고 있다. 그 모양이 더 간절하다. 사람 사는 이치도 그와 같아서, 기원이 간절할수록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아 보인다.
밑동 굵은 소나무가 돌탑을 비호하듯 서있다. 나뭇가지 사이에 누군가 만들어 올려놓은 작은 새집에서 온기를 느낀다. 정방사주차장 옆을 지나 휘돌아 오르는 길을 따른다. 그 끝에 정방사가 있다. 빽빽하게 들어선 소나무 줄기의 검은 윤곽 사이로 정방사 종각이 보인다.

절벽에 핀 연꽃, 정방사
절 마당으로 올라가는 길, 사람들을 처음 반기는 건 해우소, 화장실이다. 근심을 덜어낸다는 해우소가 그곳에 있는 까닭을 생각해 본다. 옛 해우소 옆에 새로 지은 해우소가 있다. 새로 지은 해우소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에 청풍호도 들고 청풍호를 감싸 안은 산줄기도 들었다. 그 풍경에 잠시 근심도 잊힐 것 같다. 잊히는 게 해결되는 건 아닐 테니, 다만 시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일 뿐.
절 마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종각이 있다. 종각 그늘에 앉아 종과 절집을 한 장면에 담아본다. 정방사는 하늘로 솟은 절벽에 간신히 붙어 있는 둥지 같은 절이다. 수직 바위 절벽 아래 작은 땅을 다지고 깎아 절집을 세울 터를 만든 것 같다.
정방사는 신라 문무왕2년(662년)에 정원스님이 창건했다고 전한다. 정원스님은 의상대사의 제자였다.
정원이 의상에게 물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 순간도 멈춰있지 않으니, 부처와 중생의 근본이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생에게 널리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원의 깨달음을 안 의상은 뜻밖의 대답을 꺼냈다. “내 지팡이를 따라가다가 멈추는 곳에 절을 지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다. 그 산 아랫마을 윤씨 성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면 뜻을 이룰 것이다.”
정방사가 생긴 설화다. 안내에 따르면 조선시대 순조와 헌종 때 지금의 원통보전이 중수 됐다. 한글로 풀어 쓴 원통보전 주련을 옮긴다.
[하늘보다 높은 것은 도리어 아래로 내려가고/맑은 물은 깊어질수록 검어진다./수행자가 불국정토에 있으니 작은 욕심도 없고/나그네 신선세계를 들어서니 늙음도 슬프지 않네]
주련의 문구, 불경의 내용 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건 절벽에 피어난 연꽃, 정방사 마당 앞에 펼쳐지는 풍경이다. 절집 추녀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물결처럼 너울거리는 산줄기를 만들고 청풍호에 닿아 파문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풍경소리가 눈 아래 산하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진다.
청풍호 자드락길 2코스의 시작 능강계곡
자드락길이란 나지막한 산기슭의 비탈진 땅에 난 좁은 길이란 뜻이다. 자드락길은 1코스부터 7코스까지 있는 데 각각 길의 특징이 있어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중 능강교에서 정방사까지 이어지는 길이 ‘청풍호 자드락길 2코스 정방사길’이다.

정방사길은 2.5㎞ 정도 된다. 정방사로 올라갔던 길로 다시 돌아와야 하니 왕복 5㎞를 걸어야 하는 셈이다.
그길 시작 지점인 능강계곡은 조선시대부터 경치 좋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옛 사람들은 능강계곡에서 아름다운 아홉 가지 풍경을 골라 이름을 붙였다. 쌍벽담, 몽유담, 와운폭, 관주폭, 용주폭, 금병대, 연자탑, 만당암, 취적대가 그것이다.
그중 쌍벽담, 몽유담, 와운폭, 관주폭은 충주댐이 생기면서 물에 잠겼다. 그리고 다섯 번째 풍경인 용주폭도 온전한 옛 모습을 잃고 그 일부만 남았다.
너럭바위 위로 흐르는 계곡 물줄기가 부서지며 진주 같은 물방울이 튀어 오르는 풍경을 보고 옛 사람들이 용주폭이라고 했다. 지금 남아있는 용주폭의 길이가 20~30m이고 그 아래 물줄기가 고였다 흐르는 곳까지 치면 규모가 엄청나다. 게다가 충주댐이 생기면서 물에 잠긴 곳까지 치면 옛 사람들은 지금보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을 것이다.
능강교 아래 작은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맑은 웅덩이에 고였다 너럭바위 위로 미끄러지듯 흐른다. 흐르는 물에 손을 씻고 너럭바위에 앉아 물이 흘러가는 쪽을 바라본다. 풍경이 익숙해질 무렵 자리를 털고 일어나 능강교로 올라가 정방사길을 걷기 시작한다.

누군가의 기원을 담은 돌탑들
능강교에서 출발한 걸음을 이내 멈춘다. 계곡을 건너는 다리 양쪽에 펼쳐진 풍경을 카메라에 담는다. 소나무 뿌리가 드러난 커다란 바위 아래로 푸른 물줄기가 흐른다. 물결마다 산란하는 햇볕이 물비늘을 만든다. 그 위 계곡에 크고 작은 돌멩이와 바위가 엉켜있다. 그 사이로 물이 고이고 흐른다. 계곡 기슭 커다란 바위에 작은 돌탑이 보인다. 계곡에 나뒹구는 돌멩이가 누군가의 기원을 품고 작은 돌탑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오르막 시멘트 길을 걷는다. 부드러운 흙길이었으면 걷는 마음이 더 편했을 텐데, 다만 그늘을 만드는 숲이 보호막이 되어 걷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줄 뿐이다.
올라갈수록 계곡은 도랑처럼 좁아지고 물은 말랐다. 사실 정방사로 오르는 길 옆 작은 계곡은 능강계곡의 본류가 아니다. 계곡의 본류는 조금 전 다리 위에서 보았던 푸른 물줄기 반짝이는 물비늘, 그 물줄기를 거슬러가는 물길이다. 상류로 올라가다보면 능강9경의 금병대, 연자탑, 만당암, 취적대가 나온다.
정방사로 올라가는 길은 능강9경 이름 붙은 풍경을 찾아가는 길은 아니기에, 팍팍한 다리 느린 걸음으로 조금씩 정방사를 향해 갈 뿐이다.
바람이 숲을 통째로 흔든다. 커다란 나무가 흥청흥청 흔들리고, 흔들리는 잔가지에서 서걱대는 소리가 난다. 위태롭게 세워진 돌탑이 그 바람에 금세 무너질 것 같다. 돌탑은 성황당 돌무지처럼 몸집이 비대하지 않다. 돌 몇 개가 쌓여 간신히 버티고 있다. 그 모양이 더 간절하다. 사람 사는 이치도 그와 같아서, 기원이 간절할수록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아 보인다.
밑동 굵은 소나무가 돌탑을 비호하듯 서있다. 나뭇가지 사이에 누군가 만들어 올려놓은 작은 새집에서 온기를 느낀다. 정방사주차장 옆을 지나 휘돌아 오르는 길을 따른다. 그 끝에 정방사가 있다. 빽빽하게 들어선 소나무 줄기의 검은 윤곽 사이로 정방사 종각이 보인다.

절벽에 핀 연꽃, 정방사
절 마당으로 올라가는 길, 사람들을 처음 반기는 건 해우소, 화장실이다. 근심을 덜어낸다는 해우소가 그곳에 있는 까닭을 생각해 본다. 옛 해우소 옆에 새로 지은 해우소가 있다. 새로 지은 해우소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에 청풍호도 들고 청풍호를 감싸 안은 산줄기도 들었다. 그 풍경에 잠시 근심도 잊힐 것 같다. 잊히는 게 해결되는 건 아닐 테니, 다만 시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일 뿐.
절 마당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에 종각이 있다. 종각 그늘에 앉아 종과 절집을 한 장면에 담아본다. 정방사는 하늘로 솟은 절벽에 간신히 붙어 있는 둥지 같은 절이다. 수직 바위 절벽 아래 작은 땅을 다지고 깎아 절집을 세울 터를 만든 것 같다.
정방사는 신라 문무왕2년(662년)에 정원스님이 창건했다고 전한다. 정원스님은 의상대사의 제자였다.
정원이 의상에게 물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 순간도 멈춰있지 않으니, 부처와 중생의 근본이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생에게 널리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정원의 깨달음을 안 의상은 뜻밖의 대답을 꺼냈다. “내 지팡이를 따라가다가 멈추는 곳에 절을 지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다. 그 산 아랫마을 윤씨 성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면 뜻을 이룰 것이다.”
정방사가 생긴 설화다. 안내에 따르면 조선시대 순조와 헌종 때 지금의 원통보전이 중수 됐다. 한글로 풀어 쓴 원통보전 주련을 옮긴다.
[하늘보다 높은 것은 도리어 아래로 내려가고/맑은 물은 깊어질수록 검어진다./수행자가 불국정토에 있으니 작은 욕심도 없고/나그네 신선세계를 들어서니 늙음도 슬프지 않네]
주련의 문구, 불경의 내용 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건 절벽에 피어난 연꽃, 정방사 마당 앞에 펼쳐지는 풍경이다. 절집 추녀에 매달린 풍경 소리가 물결처럼 너울거리는 산줄기를 만들고 청풍호에 닿아 파문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풍경소리가 눈 아래 산하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