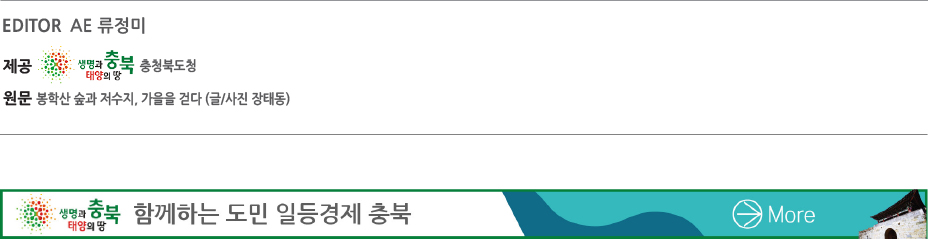커뮤니티

봉학산 숲과 저수지, 가을을 걷다
2019-10-22
라이프가이드
 여행
여행
충북 어디까지 가봤니
봉학산 숲과 저수지, 가을을 걷다
'음성 봉학골 둘레길'
충북 음성군 용산리 봉학골 산림욕장에 난 ‘봉학골 무장애 나눔길’, 무장애 나눔길에서 전망대를 오가는 숲길, 용산저수지 둘레를 한 바퀴 도는 ‘음성 쑥부쟁이 둘레길’을 이어 걷는 총 4.8km 길, 그 길에서 만난 풍경이 가을 산책 같다. 가을 속으로 걷는다.
봉학골 무장애 나눔길, 그리고 전망대에서 본 풍경
백학이 짝을 이루어 나는 형국이라고 해서 산 이름이 봉학산이다. 봉학산 계곡과 숲에 산림욕장을 만들어 누구나 함께 숲의 정기를 즐길 수 있게 했다.

봉학골 산림욕장에 조성된 봉학골 무장애 나눔길은 숲의 공기, 물을 누구나 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만든 길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 노약자 등도 숲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한 것이다.
봉학골 무장애 나눔길 왕복 2㎞, 봉학골 무장애 나눔길에서 잠깐 벗어나 전망대를 오가는 길 왕복 1.4㎞, 봉학골 산림욕장 아래 용산저수지를 한 바퀴 도는 음성 쑥부쟁이 둘레길 1.4㎞ 등 총 4.8km를 걸었다.
봉학골 삼림욕장 입구 바로 전에 주차장이 나온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작은 다리를 건너 숲으로 들어간다. 봉학골 무장애 나눔길과 음성 쑥부쟁이 둘레길을 알리는 이정표를 보고 작은 계곡을 거슬러 오르는 봉학골 무장애 나눔길로 걷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맨발숲길이 나왔다. 맨발숲길은 맨발로 걷는 길이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장기 기능을 활성화 되며 피로가 회복된다는 안내판이 보인다.
숲 기슭에 난 데크길을 걷다보면 꽃이 만발한 정원이 나오고 정원 한쪽에 전망대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보인다. 전망대까지 700m 숲길을 걷는다. 갈 지(之)자로 된 숲길을 걷다보면 데크 계단길이 나온다. 계단이 끝나는 곳이 전망대다.
전망대에 서면 용산저수지와 음성 읍내, 그 주변을 둘러 싼 산천의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고개를 돌려 바라보는 곳에 가섭산이 보이고 가섭산 정상 능선 아래 가섭사 절집 기와가 보인다.
앞으로 걸어야 할, 용산저수지 둘레에 난 ‘음성 쑥부쟁이 둘레길’을 한 눈에 넣는다. 저수지에 비치는 파란 하늘 하얀 구름을 보고 있으니 그 길이 걷고 싶어진다. 보고 있으면 걷고 싶은 길이다.

봉학골 무장애 나눔길에서 음성 쑥부쟁이 둘레길로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전망을 두고 돌아서는 발길이 아쉽다. 올라왔던 계단을 조심히 밟으며 내려간다. 올라올 때 보지 못했던 풍경이 아쉬움을 달래준다. 촘촘하게 자란 낙엽송 군락 사이로 난 길이 예쁘다. 오솔길에 떨어진 솔방울도, 색 바랜 침엽수 낙엽에 앉은 잠자리도, 아무렇지도 않게 불어 가는 숲 속의 바람도, 잰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
다시 봉학골 무장애 나눔길로 접어들었다.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무장애 나눔길이 끝나는 곳을 알리는 이정표와 안내판이 보인다. 그곳에서 돌아간다. 돌아가는 길, 계곡 옆에 꾸민 작은 연못에 피어난 수련 몇 송이를 보았다. 연못으로 내려가 꽃을 본다.
발길을 멈추게 하는 것은 그 뿐만 아니다. 잔디밭과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어우러진 풍경, 그리고 그 아래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 오후의 포근한 햇살이 ‘쉼’ 그 자체다. 바라만 봐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풍경이다. 풍경이 쉼이고 그렇게 쉬는 게 또 하나의 풍경이 된다.
그렇게 천천히 걷다가 잔디밭에 놓인 다양한 조형물 앞에서 또 걸음을 멈춘다. 오줌싸개 아이가 키를 머리에 쓴 조형물 앞에서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진다. 호랑이상에 올라타고 노는 아이들은 신이 났다. 새끼를 등에 태운 개구리 조형물 앞 커다란 신발 모양 조형물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조형물이 있는 잔디밭을 지나 차를 세워둔 주차장에 도착했다. 계곡을 건너는 작은 다리를 지나 봉학골 무장애 나눔길과 음성 쑥부쟁이 둘레길을 알리는 이정표 앞에 다시 섰다. 이번에는 음성 쑥부쟁이 둘레길 방향으로 걷는다.

쑥부쟁이 피어난 쑥부쟁이 둘레길
용산저수지를 한 바퀴 도는 음성 쑥부쟁이 둘레길 시작 지점에 쑥부쟁이의 전설을 적어 놓은 안내판이 있다.
옛날 음성 봉학골에 대장장이 가족이 살았다. 병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위해 쑥을 캐러 다니던 큰 딸을 마을 사람들은 쑥부쟁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산을 다니던 마음 착한 쑥부쟁이는 다친 노루를 보살펴 숲으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함정에 빠진 청년도 구해주기도 했다.
그 청년과 쑥부쟁이는 결혼을 약속했는데, 온다던 그 청년은 해가 바뀌어도 오지 않았고 기다리다 지친 쑥부쟁이는 산신령께 청년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렸다. 그 기원이 하늘에 닿았는지, 쑥부쟁이가 보살피고 살려줬던 노루가 나타나 노란 구슬 세 개가 담긴 보랏빛 주머니를 건네주며 구슬을 입에 물고 소원을 한 가지 씩 말하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쑥부쟁이는 첫 소원은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소원은 결혼을 약속했던 청년이 자기 앞에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두 소원 모두 이루어 졌다. 하지만 그 청년은 이미 결혼을 해서 자식까지 있는 처지였다. 마음 착한 쑥부쟁이의 마지막 소원은 그 청년이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
이듬해 봄 쑥부쟁이가 죽은 그 자리에서 푸른 싹을 틔운 생명 하나가 보랏빛 꽃을 피웠다. 사람들은 그 꽃을 쑥부쟁이라고 불렀다. 쑥부쟁이의 꽃말은 그리움과 기다림이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걷는 쑥부쟁이 둘레길에 쑥부쟁이가 한껏 피어났다. 쑥부쟁이 꽃밭에 나비가 날고 잠자리도 쉰다.
데크길이 끝나는 곳에서 흙길이 이어진다. 깎여나간 산비탈에 뿌리를 드러낸 채 나무가 자란다. 저수지에 밑동이 잠진 채 숲을 이룬 버드나무 군락을 지나 둑으로 향하는 데크길 난간에 고추잠자리 한 마리가 앉았다. 다가가도 달아나지 않는다.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담긴 저수지를 바라보며 걷는 길, 생각이 사라진다. 나도 잊힌다. 그저 걷는 걸음 그 자체만 남는다. 그렇게 풍경과 하나가 된다. 가을이 된다.
봉학골 무장애 나눔길, 그리고 전망대에서 본 풍경
백학이 짝을 이루어 나는 형국이라고 해서 산 이름이 봉학산이다. 봉학산 계곡과 숲에 산림욕장을 만들어 누구나 함께 숲의 정기를 즐길 수 있게 했다.

봉학골 산림욕장에 조성된 봉학골 무장애 나눔길은 숲의 공기, 물을 누구나 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만든 길이다. 장애가 있는 사람, 노약자 등도 숲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한 것이다.
봉학골 무장애 나눔길 왕복 2㎞, 봉학골 무장애 나눔길에서 잠깐 벗어나 전망대를 오가는 길 왕복 1.4㎞, 봉학골 산림욕장 아래 용산저수지를 한 바퀴 도는 음성 쑥부쟁이 둘레길 1.4㎞ 등 총 4.8km를 걸었다.
봉학골 삼림욕장 입구 바로 전에 주차장이 나온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작은 다리를 건너 숲으로 들어간다. 봉학골 무장애 나눔길과 음성 쑥부쟁이 둘레길을 알리는 이정표를 보고 작은 계곡을 거슬러 오르는 봉학골 무장애 나눔길로 걷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맨발숲길이 나왔다. 맨발숲길은 맨발로 걷는 길이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장기 기능을 활성화 되며 피로가 회복된다는 안내판이 보인다.
숲 기슭에 난 데크길을 걷다보면 꽃이 만발한 정원이 나오고 정원 한쪽에 전망대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보인다. 전망대까지 700m 숲길을 걷는다. 갈 지(之)자로 된 숲길을 걷다보면 데크 계단길이 나온다. 계단이 끝나는 곳이 전망대다.
전망대에 서면 용산저수지와 음성 읍내, 그 주변을 둘러 싼 산천의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온다. 고개를 돌려 바라보는 곳에 가섭산이 보이고 가섭산 정상 능선 아래 가섭사 절집 기와가 보인다.
앞으로 걸어야 할, 용산저수지 둘레에 난 ‘음성 쑥부쟁이 둘레길’을 한 눈에 넣는다. 저수지에 비치는 파란 하늘 하얀 구름을 보고 있으니 그 길이 걷고 싶어진다. 보고 있으면 걷고 싶은 길이다.

봉학골 무장애 나눔길에서 음성 쑥부쟁이 둘레길로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한 전망을 두고 돌아서는 발길이 아쉽다. 올라왔던 계단을 조심히 밟으며 내려간다. 올라올 때 보지 못했던 풍경이 아쉬움을 달래준다. 촘촘하게 자란 낙엽송 군락 사이로 난 길이 예쁘다. 오솔길에 떨어진 솔방울도, 색 바랜 침엽수 낙엽에 앉은 잠자리도, 아무렇지도 않게 불어 가는 숲 속의 바람도, 잰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
다시 봉학골 무장애 나눔길로 접어들었다.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무장애 나눔길이 끝나는 곳을 알리는 이정표와 안내판이 보인다. 그곳에서 돌아간다. 돌아가는 길, 계곡 옆에 꾸민 작은 연못에 피어난 수련 몇 송이를 보았다. 연못으로 내려가 꽃을 본다.
발길을 멈추게 하는 것은 그 뿐만 아니다. 잔디밭과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어우러진 풍경, 그리고 그 아래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 오후의 포근한 햇살이 ‘쉼’ 그 자체다. 바라만 봐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풍경이다. 풍경이 쉼이고 그렇게 쉬는 게 또 하나의 풍경이 된다.
그렇게 천천히 걷다가 잔디밭에 놓인 다양한 조형물 앞에서 또 걸음을 멈춘다. 오줌싸개 아이가 키를 머리에 쓴 조형물 앞에서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진다. 호랑이상에 올라타고 노는 아이들은 신이 났다. 새끼를 등에 태운 개구리 조형물 앞 커다란 신발 모양 조형물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조형물이 있는 잔디밭을 지나 차를 세워둔 주차장에 도착했다. 계곡을 건너는 작은 다리를 지나 봉학골 무장애 나눔길과 음성 쑥부쟁이 둘레길을 알리는 이정표 앞에 다시 섰다. 이번에는 음성 쑥부쟁이 둘레길 방향으로 걷는다.

쑥부쟁이 피어난 쑥부쟁이 둘레길
용산저수지를 한 바퀴 도는 음성 쑥부쟁이 둘레길 시작 지점에 쑥부쟁이의 전설을 적어 놓은 안내판이 있다.
옛날 음성 봉학골에 대장장이 가족이 살았다. 병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위해 쑥을 캐러 다니던 큰 딸을 마을 사람들은 쑥부쟁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산을 다니던 마음 착한 쑥부쟁이는 다친 노루를 보살펴 숲으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함정에 빠진 청년도 구해주기도 했다.
그 청년과 쑥부쟁이는 결혼을 약속했는데, 온다던 그 청년은 해가 바뀌어도 오지 않았고 기다리다 지친 쑥부쟁이는 산신령께 청년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렸다. 그 기원이 하늘에 닿았는지, 쑥부쟁이가 보살피고 살려줬던 노루가 나타나 노란 구슬 세 개가 담긴 보랏빛 주머니를 건네주며 구슬을 입에 물고 소원을 한 가지 씩 말하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쑥부쟁이는 첫 소원은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소원은 결혼을 약속했던 청년이 자기 앞에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두 소원 모두 이루어 졌다. 하지만 그 청년은 이미 결혼을 해서 자식까지 있는 처지였다. 마음 착한 쑥부쟁이의 마지막 소원은 그 청년이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
이듬해 봄 쑥부쟁이가 죽은 그 자리에서 푸른 싹을 틔운 생명 하나가 보랏빛 꽃을 피웠다. 사람들은 그 꽃을 쑥부쟁이라고 불렀다. 쑥부쟁이의 꽃말은 그리움과 기다림이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걷는 쑥부쟁이 둘레길에 쑥부쟁이가 한껏 피어났다. 쑥부쟁이 꽃밭에 나비가 날고 잠자리도 쉰다.
데크길이 끝나는 곳에서 흙길이 이어진다. 깎여나간 산비탈에 뿌리를 드러낸 채 나무가 자란다. 저수지에 밑동이 잠진 채 숲을 이룬 버드나무 군락을 지나 둑으로 향하는 데크길 난간에 고추잠자리 한 마리가 앉았다. 다가가도 달아나지 않는다.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이 담긴 저수지를 바라보며 걷는 길, 생각이 사라진다. 나도 잊힌다. 그저 걷는 걸음 그 자체만 남는다. 그렇게 풍경과 하나가 된다. 가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