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은 직접 들었을 때의 제 맛이 난다. 어떤 기계적 통로를 통해 들었을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특히 판소리는 더욱 그러하다.
TV를 통해 듣는 판소리는 솔직히 지루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거치지 않는 그대로의 소리인, 판소리를 듣게 되면 생각이 달라진다. 미음(美音)은 판소리를 하는 여인 세 명이 마음을 모아 만든 팀(Team)이다. 팀(Team)의 뜻은 ‘Together Everyone, Achieve More’의 약자라고 했던가.
함께 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이라니 그럴 듯하다. 그들이 함께 만든 새로운 판소리의 세상은 어떨까. 팀 성공의 핵심은 바로 시너지의 창조다. 그들이 만들어 낸 시너지의 소리를, 그들만의 판소리 세상을 햇볕이 쟁쟁하게 기세를 올리는 봄날에 문득 세 명이 만들어내는 화음(和音)은 어떨까 상상해봤다.

음혼(音魂)을 깨우는 선승의 죽비
판소리는 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새로운 사회와 시대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판소리는 모든 계층이 두루 즐기는 예술로 승화되기도 했다. 판소리라는 ‘판’을 통해 지배층과 피지배층은 서로의 생각을 조절하였다는 통로역할이기도 했다. 그런 면에서 판소리는 사회적 조절과 통합의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다.
판소리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충청도, 경기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전승되어 지역적 특징에 따른 소리 제(制)를 형성하고 있다. 전라도 동북지역의 소리 제를 동편제(東便制)라 하고 전라도 서남지역의 소리 제를 서편제(西便制)라 한다. 경기도와 충청도의 소리 제를 중고제(中古制)라 한다. 동편제의 소리는 비교적 우조(羽調)를 많이 쓰고 발성을 무겁게 한다. 그리고 소리의 꼬리를 짧게 끊고 굵고 웅장한 시김새로 짜여있다. 반면 서편제는 계면조(界面調)를 많이 쓰고 발성을 가볍게 하며, 소리의 꼬리를 길게 늘이고 정교한 시김새로 짜여 있다. 한편 중고제는 동편제 소리에 가까우며 소박한 시김새로 짜여 있다.

우리고장 충북에서 소리 그룹 미음(美音)에서 내는 풀어내는 판소리의 맛이 궁금하다. 판소리 환경이 열악한 충북지방에 정통 판소리를 공부한 이들은 흔치 않다. 미음에서 활동하는 함수연, 장수민, 김은정 씨는 모두 정통 판소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작은 기대로 가슴이 일렁인다.
충북도청 뒤편 중앙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들어서니 아트홀 인(人)이 사람을 반긴다. 아트홀 인은 '사람 인(人)'자의 뜻처럼 남녀노소 계층의 구별 없이 폭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 같이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출발했다.
작지만 포근한 느낌의 홀 안에는 가야금 여럿이 한쪽에 모여 천년의 세월을 담고 있다. 중간 홀과 나뉘어 두 개의 개인 연습실로 구성되어 있다. 홀 가운데 방석을 깔고 차(茶)를 마시며 판소리 이야기를 시작했다.

“초등학교 때, 가야금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판소리를 권하더군요. 성음이 좋아진다고. 제 성격이 좀 활발하다보니 무대에서 서는 것을 좋아했지요. 무엇보다 판소리가 저절로 끌려들어갔습니다.”
목원대에서 국악과 판소리를 전공한 김은정 씨의 말이다. 스스로를 노래에는 재능이 없다고 겸손하게 말하지만, 연습 삼아 가볍게 낸 소리에 ‘역시’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이상하게 전 어릴 때부터 트로트 같은 노래가 좋았어요. 신기하게도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야금소리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가야금을 배우러갔다 선생님이 제 소리를 들어보고 ‘물건이다’라고 하시더니 강력하게 판소리를 권하더군요.”
곱게 생긴 외모와 달리 소리에는 힘이 넘쳐나는 장수민 씨다. 미음의 맏언니인 함수연 씨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동편제 판소리의 명창 박록주 선생(1905~1976)의 계보를 잊는 신세대 명창이다.
그녀는 명창 박송희 선생의 수제자 채수정의 문하다. “박록주, 박송희, 채수정 선생으로 이어온 '판소리'의 계보를 잇고 싶습니다. 판소리는 하면 할수록 매력이 있지만, 끊임없는 고행의 길이기도 하지요. 우리 고장 충북에 소리의 맛을 제대로 알리고, 많은 대중이 즐길 수 있도록 저변을 넓히고 싶습니다."라고 희망을 이야기했다.
그 말이 주는 무게가 단순한 말에서 비로소 생명(生命)을 얻고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
?
전통을 지키며 대중에게 기쁨 주는 소리
가성의 소리와 진성의 소리는 다르다. 대중음악에서 기타나 반주에 맞춰 멋진 화음을 이루는 가수들의 소리는 아름답다. 대중가수들은 진성이 주를 이루지만, 기교를 한껏 부린 가성을 이용해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대개는 성량이 풍부한 가수일수록 높은 영역의 음과 낮은 역역의 음을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경계를 허물며 음역의 공간을 마음껏 유영하는 그들의 모습에 얼마나 많은 찬탄과 부러움을 보냈던가.
미음(美音)이 마음을 꺼내 소리를 냈다. 세상에 이런 소리는 처음 들었다. 이런 화음은 원시의 바람 같았다. 태고의 서로 다른 바람이 한데 어울려 내는 소리의 조화였다. 한 명이 부르는 ‘새타령’이 평면적인 옛날 영화라면 3명이 만들어 낸 ‘새타령’은 요즈음 흔히 말하는 영화 속에서 냄새도 맛도 느껴지는 4D 입체영화며 환상의 명품 오디오였다. 한쪽에서 ‘쑥꾹쑥꾹’ 새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 산과 저 산으로 넘나드는 서로 다른 음역의 판소리는 절정의 화음을 연출하고 있었다. 귀가 얼얼할 정도로 강렬하면서도 부드러웠다.
막걸리 잔에 와인을 집어넣은 색다른 맛이라고나 할까. 진성이 갖고 있는 원류가 멋을 부리면 얼마나 화려하면서도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한 판 공연이었다. 시인 도종환 씨가 언젠가 미음의 공연을 보고 난 후 “죽 쑬 줄 알았더니, 정말 좋네.”라고 했다더니. 역시 시인답게 ‘미음(美音)을 미음(米飮)’으로 은유해 표현한 최대의 칭찬이 아니었던가.
여성 소리그룹 미음은 전통과 현대를 복합한 문화콘텐츠를 통해 공연의 차별화를 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룹 구성원인 함수연, 장수민, 김은정 씨가 대중에게 쉽고 재미있는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2011년 5월 결성했다. 그룹결성 후, 보여준 ‘미음’의 행보는 일취월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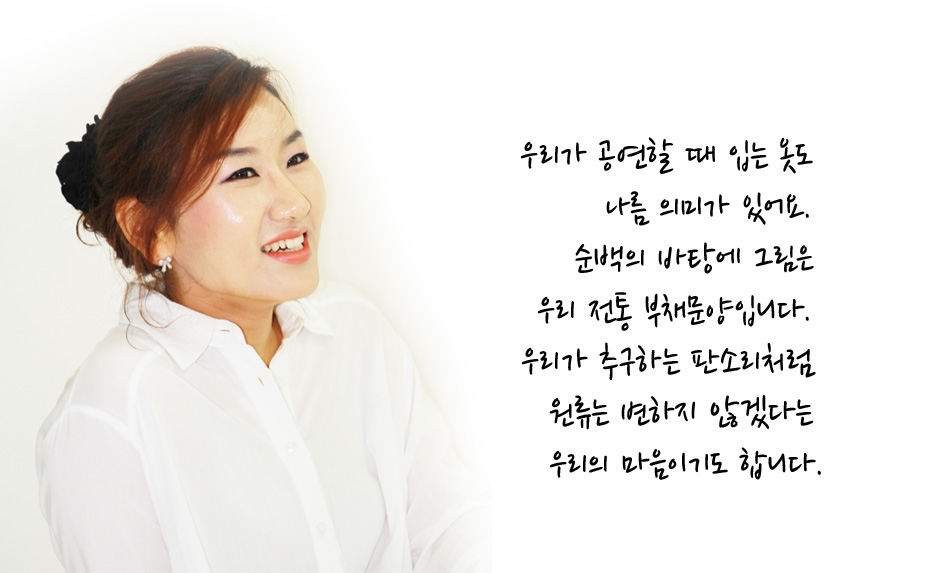
미음의 꿈은 이제 세계로 향해 있다. 구체적으로 유럽순회공연을 통해 우리의 판소리를 알리고 싶은 것이다. 고수와 판소리를 하는 일인 연기자에 의한 공연이 아닌, 3명이 판소리를 통한 화음의 세상을 알리고 싶은 것이다. 판소리를 통해서도 서로 다른 영역의 소리를 구현하는 그들의 꿈이 이루어 질 날도 머지않았다.
미음의 장수민 씨는 “우리가 공연할 때 입는 옷도 나름 의미가 있어요. 순백의 바탕에 그림은 우리 전통 부채문양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판소리처럼 원류는 변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라며 “혼자 판소리 공부를 할 때보다 미음이라는 공동체에 서로의 판소리 혼을 쏟아내니 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라고 말한다.
막내인 김은정 씨는 “판소리가 한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신명난 대목과 해학도 많아요. 3명이 함께 내는 미음이라는 공간에서 펼치는 우리의 소리를 신명나게 하고 싶어요.”라고 말한다. 누가 청해서 소리를 하지 않는다. 저절로 어깨춤이 나며 몸에서 마음에서 소리가 흘러나온다. 피아노 선율에 맞춘 ‘이별가’와 제주도 민요 ‘너영나영’이 흐르는 아트홀 인(人)에서 사람들의 삶이 구성지게 흘렀다.

-
2025-05-21 10:08:05

-
2025-05-07 09:46:51

-
2025-04-23 09:38:12

-
2025-04-09 09:05:50

-
2025-03-26 09:4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