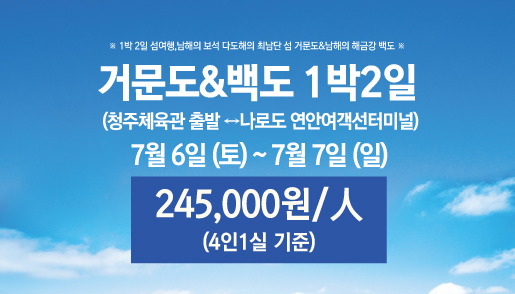교차로여행


NZINE 에디터
2016-02-03
총소리가 우리들에게는 고마운 종소리-겨울사냥
''

출발, 겨울 사냥
지난 16일, 올 들어 가장 추운 영하 10도를 웃도는 날씨. 기자는 엽사 경력 20여년의 김(65)포수와 15년 경력의 육(61)포수, 13년 경력의 신(58)포수를 따라 올 겨울 수렵허가 지역인 진천군 지역으로 겨울사냥을 나섰다. 사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냥개다. 함께 동반한 사냥개는 세터종이다. 이름은 찬과 퉁퉁이 그리고 쿡쿡이다. 육포수는 “퉁퉁이는 새끼 때 일을 ‘퉁퉁’ 저질러서 퉁퉁이라 지었고, 쿡쿡이는 사냥 갈 때면 내 다리를 자꾸 ‘쿡쿡’ 찔러서 쿡쿡이라고 지었다.”라며 활짝 웃는다. 육포수의 웃음사이로 햇살이 부딪힌다. 사냥개들은 차량 뒷문을 열자, 익숙한 듯 재빨리 올라탔다.
출발은 정확히 9시다. 벌써 코끝이 아릴 정도로 매서운 추위가 은근히 걱정스러웠다. 허연 입김은 차안에서도 내뿜어진다. “사냥하기 전에 주의할 항 같은 것 있나요?”라고 묻자, 김포수는 “화장품을 바르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또 어떤 사냥꾼은 나쁜 꿈을 꾸면 그날 사냥을 포기하기도 한다. 담배는 절대 금물이다.”라며 힐끔 육포수를 바라본다. 육포수는 담배를 하루 3갑 피우는 골초다. “아이고 형님, 저도 이제 담배 끊었습니다.”라며 너스레를 떤사다. 사냥터로 가기 전, 사천동지구대에서 총을 찾아왔다. 김포수의 총은 이태리 산 베레타로 유레카391종 4연발. 육포수와 신포수의 총은 이태리 산 베네리 5연발이다. 오늘 사냥감은 꿩과 고라니다. 색다른 신천지, 사냥터로 떠나는 마음이 마냥 설랬다.

다시 눈은 내리고
이제 야생 멧돼지는 서식지에서 천적이 사라지면서 개체수가 늘어나 생태계 질서마저 뒤바꿔 놓았다. 나무의 밑동을 파헤쳐 고사시키고 숲을 헤집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등 천덕꾸러기가 된 지 오래다. 몇 해 전에는 영동에서 야생 멧돼지에 물려 노인이 숨지는 사건도 발생됐다. 유해 조수는 야생멧돼지만이 아니다. 고라니의 피해는 더하다. 농작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산짐승은 멧돼지보다 오히려 고라니가 더 심각하다고 한다. 고라니 때문에 산 주변에 콩을 심는 것은 아예 포기해야 할 정도라고 한다. 진천군 선옥마을에 사는 권민준(64)씨는 “고라니가 다녀간 자리는 벼가 쓰러져 여물지 않고 풀만 무성하게 자란다.”라며 “겨울에 사냥을 많이 해서 다 잡아가주면 고맙겠다. 한겨울에 들리는 총소리가 우리 농민들에게는 고마운 종소리처럼 들린다.”라고 말했다.
이월이라는 표지판이 눈이 들어오면서 차는 갈대가 무성한 하천가로 방향을 틀었다. 차량 바퀴가 진흙더미에 파묻혔지만 4륜구동의 위력을 막을 수는 없었다. “반들반들하네.”라고 육포수가 중얼거린다. 이미 사냥꾼들이 많이 다녀갔다는 뜻이다. 1시간동안 하천의 갈대를 헤매고 다니다 육 포수가 손을 들었다. “햇발자국이다.”라고 나지막이 말한다. 하얀 눈 위에 고라니 발자국이 선명했다. 방금 지나간 흔적이다. 방향은 종잡을 수 없이 산만했다. 찬은 아래쪽 갈대밭으로 내닫고 포수들은 긴장한 듯 찬의 움직임만 뚫어질 듯 주시한다. 10여분 뒤, 찬이 덤불 앞에서 포인(사냥개가 주인으로 하여금 가까운 거리에 사냥감이 있으니 사격준비를 하라는 표시)을 했다. 잠시 후 김포수가 “물어!”라고 외치자, 찬이 달려듬과 동시에 두 마리의 고라니가 반대방향으로 튀었다. ‘탕, 탕, 탕!’ 고막을 찢을 듯 총소리가 울렸다. 산 쪽으로 달아나던 고라니는 이미 종적을 감추었지만, 들로 내달리던 고라니는 한순간 푹 고꾸라졌다. 찬은 달아나는 고라니를 뒤쫓았다. 그때 다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고라니가 흘린 핏자국을 눈이 다시 덮고 있었다. 혀를 길게 빼물고 허연 김을 연신 입에서 내뿜는 찬은 쓰러져 있는 고라니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고라니의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하고 맑은 눈이었다. 마음이 싸하게 아파왔다. 멀리서 청둥오리의 날개 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하늘에서는 송골매가 빙빙 돌았다.

비상 그리고 추락
사냥개 퉁퉁이가 덤불속을 헤집는데 한 마리 꿩이 날아올랐다. “탕, 탕!” 신포수가 하늘로 날아오른 꿩을 향해 쏘았지만, 빈 나뭇가지만 떨어뜨렸다. 꿩의 비행시간은 짧다. 일행은 꿩이 날아간 반대쪽 산을 향해 이동했다. 커다란 산 두 개를 넘으니 온 몸의 힘이 빠져나갔고, 땀은 몸에 차올랐다. 겹쳐 입은 옷들이 둔하고, 버거웠다. 등산은 일정한 산길을 따라 오르면 그만이지만, 사냥은 온갖 가시덤불과 나뭇가지를 헤치고 나아가야만 했다. 바위를 넘고, 물을 건너 눈(眼)으로 길을 만들며 가는 것이다. 사냥은 기다림과 집요한 추격의 연속이었다. 사냥개는 포수의 예민한 촉수였다. 검불과 숲을 거침없이 수색해 들어가며 보이는 모든 행동을 포수는 읽어낸다. 사냥개가 몸짓으로 신호를 보내면 포수는 신호를 읽고 해석하고 판단한다. 사람이 갈 수 없는 수풀과 험로를 수색해가는 사냥개는 주기적으로 주인에게 돌아와 꼬리를 흔들며 애정을 확인하고 다시 내달린다.
햇살이 잦아들자, 물색이 어두웠다. 산의 저녁은 쉬이 온다. 온 몸에 한기가 어릴 무렵, 다시 총성이 울려 퍼졌다. 한 일(一)자로 비상하던 꿩이 ‘ㄱ’자로 꺾여 땅으로 추락했다. 비상(飛上)과 추락(墜落)이 극명했다.

해당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0-12-30 10:17:28

-
2019-06-03 09:09:21

-
2019-05-24 16:05:38

-
2019-05-20 11:42:43

-
2019-05-16 09: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