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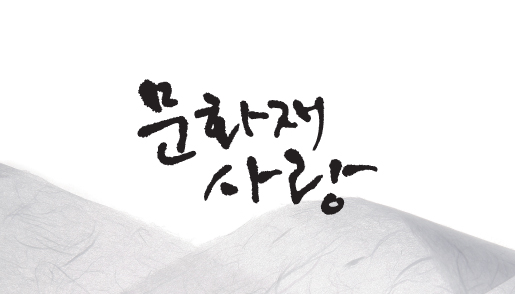
해가 진다 달이 뜬다 음악이 된다
2018-08-03
문화
 문화놀이터
문화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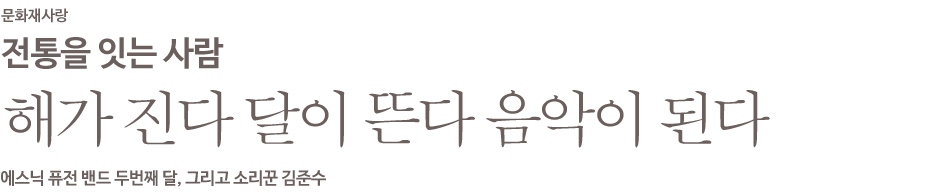

하늘하늘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봄바람. 섬섬옥수 보드라운 손으로 춘향이가 그네를 탄다. 치맛자락을 취날리며 싱긋, 날리는 헤픈웃음. 이 웃음에 반한 이몽룡은 방자에게 분부를 내린다. "방자야, 춘향을 불러 오너라" 분부를 받잡고 날린 걸음으로 춘향에게 향하는 방자. 봄바람에 붉게 물든 꽃잎이 허공에 하늘 하늘 날린다. 비로소 춘향과 이몽룡의 이야기가 시작 되는 것이다. 두번째 달의 연주와 함께 떨리는 첫사랑을 시작하는 이몽룡과 성춘향. 그들의 연주를 눈을 감고 듣고 있으면 마치 춘향이 눈앞에서 그네를 뛰는 듯하다.

그들이 하는 우리의 음악

판소리는 음악극이다. 화자인 소리꾼이 사람들을 쭉 모아놓고, 혼자 서서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부른다. 등 장하는 악기는 북이 전부다. 장단에 맞춰 펼쳐지는 부채 정도가 소품이 될 뿐이다. 그럼에도 소리꾼의 기교, 고수의 북소리, 구경꾼의 추임새는 완벽한 하나의 극을 완성한다. 여러 개의 악기와 무대장치로 꽉 차는 현대극에 비하면 단조롭기 그지없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이 최선이었을지 모른다. 많은 악기도, 장치도 없던 때였으니 말이다. 만약 그 시대에도 다양한 악기가 있었다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두번째 달과 소리꾼 김준수. 왼쪽부터 박진우(베이스), 최진경(건반), 김준수(소리꾼), 이영훈(기타), 김현보(기타,만돌린), 백선열(드럼,퍼커션),조윤정(바이올린)
에스닉 퓨전 밴드 ‘두번째 달’은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든 그룹이다. 판소리에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드럼과 같은 서양 악기를 입혔다. 억센 소리꾼의 소리가 부드러운 재즈풍의 음악을 뚫고 나오지만,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국악이 어법을 바꿔서 서양 악기와 어울리도록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없었죠. 저희는 원본을 훼손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원형 그대로 어울릴만한 연주곡을 썼습니다.(리더 김현보)” 소리꾼의 노래인 ‘창’과 말을 읊는 ‘아니리’는 연주곡에 맞게 축약하거나 생략했다. 워낙 대목이 길기 때문에 한 곡의 연주곡에 담아내려는 노력이었다. 하지만 남아있는 부분만큼은 원형 그대로다.
국악기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해금처럼 국악 특유의 한이 서린 악기가 없음에도 그들의 음악은 판소리에 휘 감긴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 “곡을 쓰기 전에 국악과 연주곡의 접점을 고민해요. 국악에는 장단 이 있거든요. 느리고 완만한 장단부터 급하게 휘몰아치는 장단까지, 서양 음악으로 치면 리듬인 거죠. 작업 하려는 판소리를 여러 번 듣고 리듬적인 접점을 확인하면 그때부터는 서로 고민 없이 각자의 것을 하기 시작 합니다.(건반 최진경)” 두번째 달의 멤버 여섯은 각자 다루는 악기가 한두 개씩 있다. 작곡은 여섯 명 모두가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 작업한다. 어느 악기가 주로 나오느냐에 따라 중심 곡조가 달라지긴 하지만, 만들어온 곡의 분위기는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 뼈대가 갖춰지면 합주를 통해 세세한 부분을 쌓아올려 완성해간다. 이것이 <판소리 춘향가> 앨범을 만든 방법이자 15년간 그들이 월드 뮤직을 해온 방법이었다.

드라마는 가고, 음악은 남다

두번째 달은 스스로를 밴드보다 음악이 더 유명하다고 말한다. 두번째 달의 팬들은 거의 드라마 OST를 듣고부터 생겨났을 정도로 그들의 음악은 여운이 깊다. 드라마 <아일랜드>, <궁>, <구르미 그린 달빛>, <푸른 바다의 전설> 등 수많은 OST와 광고에 그들의 음악이 있었다. 음료 ‘포카리스웨트’의 광고음악 역시 두번째 달의 것이 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이 음악은 아직도 제품 광고에 사용된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도 참여했다. ‘쾌지 나칭칭’을 연주곡으로 작업해 폐회식날 입장하는 92개국 선수단을 신명나게 했다. 이렇게 두번째 달은 정규 앨범 이외에도 다양한 곡 작업을 꾸준히 해온 덕에 대표곡이 많다. 때문에 최근 <판소리 춘향가>에 이어 국악인 송소희와 함께한 <모던민요>까지 국악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국악 밴드로 오해받기도 한다. “드라마 OST도 그렇고, 국악도 그렇고 저희는 그냥 저희의 음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번째 달에 국악이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리더 최현보)” “월드 뮤직을 하는 팀이 지금은 한국의 음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소리를 빼고 들으시면 그냥 저희의 연주곡으로 들리실 거예요.(바이올린 조윤정)”
실제로 두번째 달은 국악 프로젝트를 하며 기존에 발표한 연주곡에 판소리의 한 대목을 얹기도 했다. <판 소리 춘향가>의 ‘이별가’가 그랬다. 그들의 대표곡인 드라마 <궁>의 OST ‘얼음 연못’에 ‘이별가’를 얹었지 만 이는 애초에 의도된 듯 처연하고 슬펐다. 이렇듯 따로 만들어진 음악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저에 깔린 정서가 같았기 때문이다. 하나의 테마가 정해지면 두번째 달은 그 테마에 맞는 악기와 세계 음악의 요소들을 꺼내 쓴다. 만돌린, 아이리시 휘슬, 아코디언, 일리언파이프 등 밴드가 다룰 줄 아는 악기는 다양하다. 여기에 아일랜드, 라틴, 집시 음악 등 세계 각국의 음악적 요소가 더해져 음악은 빈틈없이 풍성해진다.

01.10년 만에 나온 두번째 달의 2집 <그동안 뭐하고 지냈니?>의 앨범사진
02.두번째 달은 메인 가수가 없는 밴드로서, 무대에서 다양한 연주곡을 공연한다.
03.젊은 소리꾼 김준수는 얼마 전 판소리 <수궁가>를 완창해 실력을 인정받았다.
04.함께 눈빛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두번째 달 멤버들
05.두번째 달의 <판소리 춘향가> 작업에 참여한 소리꾼 김준수가 소리를 하고 있다.

15년간의 호흡, 그 안에 박힌 마음들

2003년, 밴드가 결성되고 지금까지 참 많은 것이 바뀌었다. 리더인 김현보는 밴드 활동을 하며 다룰 줄 아 는 악기가 많아졌다. 어렸던 멤버들의 나이는 결성 당시 나이보다 많아졌다. 10년 전만 해도 직접 유럽의 음악을 들으러 가야 했지만, 이제는 앉아서 검색하며 들을 수도 있다. 변하지 않은 것은 오직 멤버들의 마음뿐 이었다. “오랫동안 음악을 하다 보니 일이나 예술가로서의 활동이라는 느낌보다는 내 삶이고 생활이라는 느낌이 많아요. 일어나서 고민 없이 하게 되는 일상 같은거죠.(베이스 박진우)” 이제 그들에게 서로는 일상이다. 가족보다도 더 자주 보고, 소통하며, 누가 무엇을 잘하는지 속속들이 아는 사이. 음악으로서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다 보니 그렇게 되어 버렸다. 기쁨, 슬픔, 사랑을 표현한다는 건 그런 것이다. 그 마음을 음악에 담아내는 것 또한 그렇다. 그래서 두번째 달이 하는 음악은 어느 것 하나로 규정짓기가 어렵다. 세계 각국의 음악 중 어느 나라의 것을 가져왔는지 찾기보다, 그 안에 어떤 마음을 담았는지 고민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 음악이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니 말이다. “두번째 달이라는 이름도 달이 두개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에서 비롯됐어요. 춘향가의 재구성도 마치 영상음악 작업과도 같았죠. ‘사랑가’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상상하고, ‘이별가’에서는 슬픈 마음을 상상하고요.(건반 최진경)” 그들이 하늘 아래 두 개의 달을 상상했듯, 그들이 하는 음악은 세상에 없는 두 번째를 상상한다. 그래서 음악도 공연도 늘 놀랍도록 새로운 빛을 발한다.
그 옛날 사람들에게도 판소리는 공연이고 음악이었다. 장날을 기다리는 이유이자, 양반들도 서민들 고개 너머 까치발을 들게 했을 재미난 공연이었다. 신명나는 창 소리에 섞여 양반 욕도 실컷 했다가 풋풋한 사랑 이야기에 설레기도 하고, 소리꾼의 능청스런 연기에 웃음 지었을 사람들. 지금의 우리가 공연이나 드라마를 즐기는 이유와 같았을 것이다. 감정을 해소하고 공감하는 무대가 되어준 시끌시끌한 저잣거리. 그 시대에 열린 창극 한 마당은 그들에게 무척이나 소중했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두번째 달의 음악처럼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