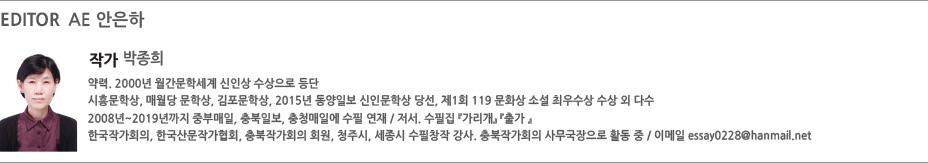커뮤니티

뒷목이 되다
2020-09-23
문화
 문화놀이터
문화놀이터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뒷목이 되다
'글. 박종희'
휠체어에 앉은 할머니들이 콩을 고르고 계신다. 노랗고 반들반들한 콩과 검정 서리태가 마구 섞인 바구니에서 찌그러진 콩을 골라내는 일이다. 기름기 없이 까칠하고 투박한 할머니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한쪽 귀퉁이에 쭈글쭈글한 콩이 걸러져 나간다. 할머니가 골라낸 못생기고 찌그러진 콩이 당신들처럼 뒷목 같은 신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아릿해진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머니가 계신 노인병원에 간다. 종일 침대에 누워 아는 얼굴이 들어올 때만 기다리시는 어머니 때문에 나 자신과 한 약속이다. 웬만하면 그 약속을 깨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삶의 시계는 이상하게도 다르게 돌아갈 때가 있다. 누워서 손을 가지고 놀던 어머니가 나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환해진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작은 며느리잖아?”라고 하시며 마른 감잎처럼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 같이 야윈 손을 내민다.
턱받이를 두르고 포크를 꺼내는 잠깐도 못 참겠다는 듯이 어머니는 얼른 부침개 한 개를 입으로 가져간다. 꿀꺽꿀꺽 부침개 넘어가는 소리가 맛있게 들린다. 이가 없는데 김치부침개를 잘 드시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다. 금방 만들어 따뜻한 부침개를 말씀도 안 하시고 드시던 어머니는 “이 맛은 여전하군, 맛있어.”라고 하시며 나한테도 먹으라는 시늉을 한다. 별것도 아닌 부침개를 맛있게 드시는 어머니를 보니 그저 고맙고 가슴이 뭉클해진다.

어머니는 8년째 노인병원에 계신다. 파킨슨병과 치매 증상이 있었는데 입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걸음이 부자연스럽더니 이젠 아예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지내신다. 어머니가 계시는 병실에는 비슷한 증상을 가진 여섯 분의 할머니가 계신다. 대부분 마지막 구간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다.
어머니 바로 맞은편에 계시는 송 할머니는 60대인데 치매에 걸렸다. 1분 간격으로 밥 달라, 약 달라고 하는 송 할머니는 공직에서 정년을 마친 바지런하고 깔밋한 성격을 가진 분이다. 곱상한 얼굴에 예의도 바르셔서 우리가 들어가면 먼저 인사하고 어떤 말도 함부로 하시는 적이 없다.
부침개를 드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고 병들면 못 노나니.”라고 하시면서 병실이 떠나갈 만큼 큰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가끔 구구단도 외우고 간병인 아줌마들과 농담을 잘하는 어머니는 아주 소극적이고 말수가 적은 분이셨다. 입원하시던 첫해에는 병원 생활에 적응 못 하고 매사에 피새를 잘 내 걱정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성격은 낙천적이고 둥글게 변해갔다.
아들인 남편이나 내가 보기에도 깜짝 놀랄 만큼 농담을 잘하고 어린애처럼 표정도 다양해졌다. 사람마다 치매의 증상이 다르다더니 어머니는 낙천적으로 오신 것 같다. 웬만해선 화내지 않고 늘 웃는 어머니를 간호사들과 간병인들도 참 좋아한다. 같이 계시는 다섯 분은 가끔 짜증을 부리기도 하는데 어머니는 병실을 마치 집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 병실을 당신의 집으로 생각하고 같이 계시는 분들을 어머니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로 착각하실 때가 많다.
어머니의 기억에 내장된 저장고 안에 가장 행복하고 따뜻했던 시절은 큰 기와집을 지어 살 때였던 것 같다. 그 집에서 살던 때를 회상할 때면 어머니의 얼굴엔 화색이 돈다. 바깥채를 젊은 부부한테 세 주고 살았는데 어머니는 지금 그 시절에 머물러계신다. 할머니들이 수돗물을 틀어 손을 씻으면 물세 많이 나온다고 역정을 내시고 집세 받았느냐고 물을 때가 있다. 그래도 행복했던 순간에 머물러 계신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다.
마침, 할머니 한 분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온몸에 주렁주렁 줄을 달고 계신다. 치매에 당뇨와 고혈압까지 있어 몸에 온통 링거 줄이다. 통증 때문인지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로 우는 할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어머니가 부르던 노래를 중단한다. 어머니도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다고 예감하는 것 같다.
노인병원에 오면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든다. 병실에서 젊은이들의 얼굴을 보는 일은 극히 드물다. 간호사와 간병인을 제외하고는 가족들과 부딪히는 일도 거의 없다. 마치 병실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삶과 죽음 두 개의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만 같다.
힘없이 집어 든 부침개가 떨어져 언덕 없이 졸아붙은 어머니의 가슴팍으로 파고든다. 오 남매가 자라면서 마치 강아지 새끼처럼 갉아 먹던 곳이다. 뽀얀 속살 위에 화수분처럼 퍼 올리던 가슴이 의무를 다했다는 듯이 콩자반처럼 거뭇한 젖꼭지만 남아있다.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라면 어머니는 이제 생성의 과정을 마치고 서서히 소멸하여 가는 중이다.

뒷목은 낱알을 거둬들일 때 남는 찌그러지고 처진 곡식이다. 고향에서 소일삼아 농사짓던 어머니는 알곡보다도 북데기 속에 섞여 있는 뒷목에 더 애착을 가지셨다. 뒷목도 허기진 어떤 이에게는 한 끼의 따뜻한 식량이 된다면서 잘고 찌그러져 검불 속에 처져있는 것들을 일삼아 골라 담으셨다. 그렇게 어머니 손으로 다시 들어온 뒷목들은 알곡과 같이 푹푹 삶아 단단한 메주로 태어나기도 했다.
요양원에 가면 뒷목처럼 쓸쓸해진다는 것을 미리 아셨던 걸까. 어머니는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셨다. 요양원이 아니고 어머니 병을 치료하는 노인병원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다. 버려질까 봐 두렵고 무서워 죽어도 병원에는 안 가겠다고 하는 어머니를 설득해 입원시키고 나서 우리 부부는 참 많은 눈물을 쏟아냈다.
새로 들어온 할머니의 슬픈 신고식에 초연해졌던 뒷목들이 다시 도란도란 수다 판을 벌인다. 잘 마른 나뭇잎 같은 할머니들이 시작도 끝도 없이 뱉어내 놓는 말들이 수런거리며 허공에 흩어진다. 당신이 면장이라고 우기는 영희 할머니와 아들보다 당신이 먼저 죽을까 봐 늘 걱정이라고 하는 영은 할머니의 측은한 대화를 듣고 있자니 웃음도 나오고 눈물도 나온다. 아까울 것 없이 평생 자식들한테 다 내어주고 이젠 빈 그루터기처럼 앙상해 더는 거둬들일 것도 내어놓을 것도 없는 팔순의 노모들이다.
그들과 함께 삶의 저녁에 서 있는 어머니가 어서 가라며 마른 손을 흔든다. 순간 가슴이 울컥하고 느꺼워진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어머니가 계신 노인병원에 간다. 종일 침대에 누워 아는 얼굴이 들어올 때만 기다리시는 어머니 때문에 나 자신과 한 약속이다. 웬만하면 그 약속을 깨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삶의 시계는 이상하게도 다르게 돌아갈 때가 있다. 누워서 손을 가지고 놀던 어머니가 나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환해진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작은 며느리잖아?”라고 하시며 마른 감잎처럼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것 같이 야윈 손을 내민다.
턱받이를 두르고 포크를 꺼내는 잠깐도 못 참겠다는 듯이 어머니는 얼른 부침개 한 개를 입으로 가져간다. 꿀꺽꿀꺽 부침개 넘어가는 소리가 맛있게 들린다. 이가 없는데 김치부침개를 잘 드시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다. 금방 만들어 따뜻한 부침개를 말씀도 안 하시고 드시던 어머니는 “이 맛은 여전하군, 맛있어.”라고 하시며 나한테도 먹으라는 시늉을 한다. 별것도 아닌 부침개를 맛있게 드시는 어머니를 보니 그저 고맙고 가슴이 뭉클해진다.

어머니는 8년째 노인병원에 계신다. 파킨슨병과 치매 증상이 있었는데 입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걸음이 부자연스럽더니 이젠 아예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지내신다. 어머니가 계시는 병실에는 비슷한 증상을 가진 여섯 분의 할머니가 계신다. 대부분 마지막 구간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다.
어머니 바로 맞은편에 계시는 송 할머니는 60대인데 치매에 걸렸다. 1분 간격으로 밥 달라, 약 달라고 하는 송 할머니는 공직에서 정년을 마친 바지런하고 깔밋한 성격을 가진 분이다. 곱상한 얼굴에 예의도 바르셔서 우리가 들어가면 먼저 인사하고 어떤 말도 함부로 하시는 적이 없다.
부침개를 드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고 병들면 못 노나니.”라고 하시면서 병실이 떠나갈 만큼 큰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가끔 구구단도 외우고 간병인 아줌마들과 농담을 잘하는 어머니는 아주 소극적이고 말수가 적은 분이셨다. 입원하시던 첫해에는 병원 생활에 적응 못 하고 매사에 피새를 잘 내 걱정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성격은 낙천적이고 둥글게 변해갔다.
아들인 남편이나 내가 보기에도 깜짝 놀랄 만큼 농담을 잘하고 어린애처럼 표정도 다양해졌다. 사람마다 치매의 증상이 다르다더니 어머니는 낙천적으로 오신 것 같다. 웬만해선 화내지 않고 늘 웃는 어머니를 간호사들과 간병인들도 참 좋아한다. 같이 계시는 다섯 분은 가끔 짜증을 부리기도 하는데 어머니는 병실을 마치 집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다. 병실을 당신의 집으로 생각하고 같이 계시는 분들을 어머니 집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로 착각하실 때가 많다.
어머니의 기억에 내장된 저장고 안에 가장 행복하고 따뜻했던 시절은 큰 기와집을 지어 살 때였던 것 같다. 그 집에서 살던 때를 회상할 때면 어머니의 얼굴엔 화색이 돈다. 바깥채를 젊은 부부한테 세 주고 살았는데 어머니는 지금 그 시절에 머물러계신다. 할머니들이 수돗물을 틀어 손을 씻으면 물세 많이 나온다고 역정을 내시고 집세 받았느냐고 물을 때가 있다. 그래도 행복했던 순간에 머물러 계신 어머니가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지 모르겠다.
마침, 할머니 한 분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온몸에 주렁주렁 줄을 달고 계신다. 치매에 당뇨와 고혈압까지 있어 몸에 온통 링거 줄이다. 통증 때문인지 어린아이처럼 큰 소리로 우는 할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어머니가 부르던 노래를 중단한다. 어머니도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다고 예감하는 것 같다.
노인병원에 오면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든다. 병실에서 젊은이들의 얼굴을 보는 일은 극히 드물다. 간호사와 간병인을 제외하고는 가족들과 부딪히는 일도 거의 없다. 마치 병실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삶과 죽음 두 개의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만 같다.
힘없이 집어 든 부침개가 떨어져 언덕 없이 졸아붙은 어머니의 가슴팍으로 파고든다. 오 남매가 자라면서 마치 강아지 새끼처럼 갉아 먹던 곳이다. 뽀얀 속살 위에 화수분처럼 퍼 올리던 가슴이 의무를 다했다는 듯이 콩자반처럼 거뭇한 젖꼭지만 남아있다.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라면 어머니는 이제 생성의 과정을 마치고 서서히 소멸하여 가는 중이다.

뒷목은 낱알을 거둬들일 때 남는 찌그러지고 처진 곡식이다. 고향에서 소일삼아 농사짓던 어머니는 알곡보다도 북데기 속에 섞여 있는 뒷목에 더 애착을 가지셨다. 뒷목도 허기진 어떤 이에게는 한 끼의 따뜻한 식량이 된다면서 잘고 찌그러져 검불 속에 처져있는 것들을 일삼아 골라 담으셨다. 그렇게 어머니 손으로 다시 들어온 뒷목들은 알곡과 같이 푹푹 삶아 단단한 메주로 태어나기도 했다.
요양원에 가면 뒷목처럼 쓸쓸해진다는 것을 미리 아셨던 걸까. 어머니는 병원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셨다. 요양원이 아니고 어머니 병을 치료하는 노인병원이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었다. 버려질까 봐 두렵고 무서워 죽어도 병원에는 안 가겠다고 하는 어머니를 설득해 입원시키고 나서 우리 부부는 참 많은 눈물을 쏟아냈다.
새로 들어온 할머니의 슬픈 신고식에 초연해졌던 뒷목들이 다시 도란도란 수다 판을 벌인다. 잘 마른 나뭇잎 같은 할머니들이 시작도 끝도 없이 뱉어내 놓는 말들이 수런거리며 허공에 흩어진다. 당신이 면장이라고 우기는 영희 할머니와 아들보다 당신이 먼저 죽을까 봐 늘 걱정이라고 하는 영은 할머니의 측은한 대화를 듣고 있자니 웃음도 나오고 눈물도 나온다. 아까울 것 없이 평생 자식들한테 다 내어주고 이젠 빈 그루터기처럼 앙상해 더는 거둬들일 것도 내어놓을 것도 없는 팔순의 노모들이다.
그들과 함께 삶의 저녁에 서 있는 어머니가 어서 가라며 마른 손을 흔든다. 순간 가슴이 울컥하고 느꺼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