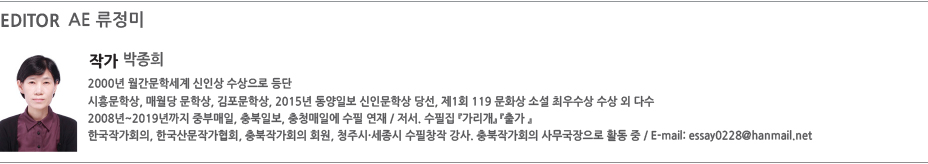커뮤니티

[수필] 낮달
2023-06-14
문화
 문화놀이터
문화놀이터
삶의 풍경이 머무는 곳
[수필] 낮달
'글. 박종희'
계절이 숨바꼭질하는 길목에 낮달 하나 외로이 걸려있다.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수척해진 낮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나를 외가로 데려다준다. 유년 시절의 기억 대부분을 외가가 잠식할 만큼 어릴 때 외가에서 보낸 날이 많았다. 외가는 산골 마을이라 어둑 발이 깔리면 괜스레 무서웠다. 소심하고 겁쟁이였던 나는 자면서도 할머니 치맛자락을 놓지 못했다.
할머니와 이모가 장에 가고 없던 그날도 이불을 뒤집어쓰고 안방에 웅크리고 있었다. 내가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 있던 시간, 갑자기 몰려온 태풍이 집 안을 온통 휩쓸어버렸을 줄이야. 뒤 뜰 장독대에 큰 항아리 두 개가 깨져 봄에 담근 간장이 모두 쏟아지고 빨랫줄에 널렸던 이모의 운동화 끈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흙에 나뒹군 이불 홑청을 거두고 비설거지 하던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납빛에 가까웠다. 아깝다고 빗물까지 쓸어 담는 할머니의 얼굴에도 간장 항아리를 지키지 못한 외손녀에 대한 원망이 깔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으리라.
항아리를 깼다고 닦달하는 이모한테 엉뚱하게 둘러댔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상상 속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온 남자를 범인이라고 믿었다. 마치 내 눈으로 본 것처럼 키가 큰 남자가 간장 항아리를 깨뜨리고 안방까지 들어와 무서워 이불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얼버무렸다. 늘 나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안방 벽 부적 속 남자를 범인이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할 수 있었다니, 무의식 중에 떠오르는 기억은 가끔 그릇됨이 있다.

외가에서는 자주 가위에 눌렸다. 혼자 있을 때는 잘 말린 표고버섯처럼 심장이 오그라 들고 뒤통수가 무서웠다. 고개를 돌리면 누군가가 확 잡아챌 것만 같아 앞엣것 만 보고 놀았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할 때면 할머니는 장독대 앞에 서서 달을 보며 빌고 계셨다. 딸을 여섯이나 낳고 아들을 넷 낳았지만, 이상하게도 아들은 네 살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버려 할머니는 아들에 대해 한이 맺힌 듯했다.
조상을 섬기듯 미신을 받들던 할머니는 객귀 물림을 믿었다. 사방이 깜깜해지도록 절을 하다가 된장 푼 바가지 위에 얹어 놓은 칼로 십자를 긋고 나서 던졌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무녀 같아 소름이 돋았다. 할머니는 칼을 던져 칼날이 바깥쪽을 향하면 신의 노함이 풀린 것이라고 믿고 칼날이 안으로 향하면 칼을 다시 던졌다.
칼을 손에 들면 할머니는 마치 부적 속 장군상처럼 기세 등등해졌다. 당장 물러가지 못하겠느냐는 서슬 퍼런 할머니의 목소리가 밤공기를 타고 집안 곳곳으로 흩어졌다. 할머니가 객귀 물림을 하고 나면 신기하게 집안이 편안해지는 것도 아니러니였다.
집안에 대를 끊었다고 자책하던 할머니는 대낮에 희미하게 떠 있다가 사라지는 낮달 같았다. 그도 그럴 것이, 양의 기운을 지닌 할머니가 백주(白晝)에 살아가려니 어찌 빛을 발할 수 있었으랴.
양기가 센 할머니는 치마만 둘렀지 여장부나 다름없었다. 병약한 할아버지를 대신해 집집이 다니며 구정물을 얻어다 돼지를 키워 생계를 꾸렸다. 힘든 일이 어디 그뿐이었던가. 할머니는 마늘 농사와 벼농사를 지으며 궂은일을 도맡아 해도 그다지 치사(致謝) 받지 못했다. 명절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담벼락을 넘어도 할머니의 정한 자리는 언제나 부뚜막이었다. 몇 장 안 되는 가족사진 속에도 할머니의 얼굴은 낮달처럼 멀찌감치 서나 찾을 수 있었다. 해에 묻힌 낮달은 빛나지 않듯이 할머니의 삶이 꼭, 그랬다.

때를 잘 타고났으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귀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할머니는 어쩌다가 길을 잃고 세상을 잘못 타고났을까. 형격이 왜소하고 소심해 보호 본능마저 일으키는 외할아버지와 바뀌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나이 들면서 내 기억 속의 낮달도 조금씩 대담해지는 듯했다. 더는 우물 안 수면에 조용히 떠 있던 흔적 같은 달이 아니었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할머니의 날랜 몸과 손은 빛이 났다. 누런 종 바가지와 시퍼렇게 날 선 칼을 들고 입에서 연신 푸푸 소리를 내며 신을 구슬리던 할머니. 정화수 올려놓고 비손 하느라 당신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가도 가족을 생각하는 할머니의 마음은 낮달처럼 웅숭깊었다.
할머니는 울화병으로 자리에 누우신 할아버지를 지성으로 보살폈다. 젊어서 받던 설움을 생각하면 한소리 할 만도 한데 할머니는 가타부타하지 않았다. 편편 약골이라 늘 자리보전하던 할아버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당신 곁을 지키던 할머니 손을 잡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다.
낮에 나와 대접 못 받는 낮달이나 구붓하게 이지러진 만월이나 저마다 존재하는 것들은 아프다. 따지고 보면 아들을 못 낳은 죄로 허허로운 삶을 살아온 할머니나 아들 핑계로 집안을 겉돌던 할아버지의 고통도 매한가지였으리라. 고통의 무게는 다르지만, 서로에게 맡겨진 불행을 깔고 주저앉아 살 수밖에 없었던 두 분의 영혼은 누가 위로할까.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40여 년이 지났지만, 낮달이 내게 주는 의미는 다르지 않다. 염탐하듯 내밀하게 걸친 낮달 위에 아직도 외가의 풍경이 겹쳐지는 것도 그 때문이지 싶다. 시(時)를 잘못 타고 나와 평생 숨죽이고 살던 할머니, 대명천지에 태어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사신 할머니 얼굴이 골목길 낮달 안에 아슴아슴 보이는 듯하다.
할머니와 이모가 장에 가고 없던 그날도 이불을 뒤집어쓰고 안방에 웅크리고 있었다. 내가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 있던 시간, 갑자기 몰려온 태풍이 집 안을 온통 휩쓸어버렸을 줄이야. 뒤 뜰 장독대에 큰 항아리 두 개가 깨져 봄에 담근 간장이 모두 쏟아지고 빨랫줄에 널렸던 이모의 운동화 끈도 흔적 없이 사라졌다.
흙에 나뒹군 이불 홑청을 거두고 비설거지 하던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납빛에 가까웠다. 아깝다고 빗물까지 쓸어 담는 할머니의 얼굴에도 간장 항아리를 지키지 못한 외손녀에 대한 원망이 깔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으리라.
항아리를 깼다고 닦달하는 이모한테 엉뚱하게 둘러댔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상상 속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온 남자를 범인이라고 믿었다. 마치 내 눈으로 본 것처럼 키가 큰 남자가 간장 항아리를 깨뜨리고 안방까지 들어와 무서워 이불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얼버무렸다. 늘 나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안방 벽 부적 속 남자를 범인이라고 천연덕스럽게 말할 수 있었다니, 무의식 중에 떠오르는 기억은 가끔 그릇됨이 있다.

외가에서는 자주 가위에 눌렸다. 혼자 있을 때는 잘 말린 표고버섯처럼 심장이 오그라 들고 뒤통수가 무서웠다. 고개를 돌리면 누군가가 확 잡아챌 것만 같아 앞엣것 만 보고 놀았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할 때면 할머니는 장독대 앞에 서서 달을 보며 빌고 계셨다. 딸을 여섯이나 낳고 아들을 넷 낳았지만, 이상하게도 아들은 네 살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버려 할머니는 아들에 대해 한이 맺힌 듯했다.
조상을 섬기듯 미신을 받들던 할머니는 객귀 물림을 믿었다. 사방이 깜깜해지도록 절을 하다가 된장 푼 바가지 위에 얹어 놓은 칼로 십자를 긋고 나서 던졌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무녀 같아 소름이 돋았다. 할머니는 칼을 던져 칼날이 바깥쪽을 향하면 신의 노함이 풀린 것이라고 믿고 칼날이 안으로 향하면 칼을 다시 던졌다.
칼을 손에 들면 할머니는 마치 부적 속 장군상처럼 기세 등등해졌다. 당장 물러가지 못하겠느냐는 서슬 퍼런 할머니의 목소리가 밤공기를 타고 집안 곳곳으로 흩어졌다. 할머니가 객귀 물림을 하고 나면 신기하게 집안이 편안해지는 것도 아니러니였다.
집안에 대를 끊었다고 자책하던 할머니는 대낮에 희미하게 떠 있다가 사라지는 낮달 같았다. 그도 그럴 것이, 양의 기운을 지닌 할머니가 백주(白晝)에 살아가려니 어찌 빛을 발할 수 있었으랴.
양기가 센 할머니는 치마만 둘렀지 여장부나 다름없었다. 병약한 할아버지를 대신해 집집이 다니며 구정물을 얻어다 돼지를 키워 생계를 꾸렸다. 힘든 일이 어디 그뿐이었던가. 할머니는 마늘 농사와 벼농사를 지으며 궂은일을 도맡아 해도 그다지 치사(致謝) 받지 못했다. 명절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담벼락을 넘어도 할머니의 정한 자리는 언제나 부뚜막이었다. 몇 장 안 되는 가족사진 속에도 할머니의 얼굴은 낮달처럼 멀찌감치 서나 찾을 수 있었다. 해에 묻힌 낮달은 빛나지 않듯이 할머니의 삶이 꼭, 그랬다.

때를 잘 타고났으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귀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할머니는 어쩌다가 길을 잃고 세상을 잘못 타고났을까. 형격이 왜소하고 소심해 보호 본능마저 일으키는 외할아버지와 바뀌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나이 들면서 내 기억 속의 낮달도 조금씩 대담해지는 듯했다. 더는 우물 안 수면에 조용히 떠 있던 흔적 같은 달이 아니었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할머니의 날랜 몸과 손은 빛이 났다. 누런 종 바가지와 시퍼렇게 날 선 칼을 들고 입에서 연신 푸푸 소리를 내며 신을 구슬리던 할머니. 정화수 올려놓고 비손 하느라 당신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 가도 가족을 생각하는 할머니의 마음은 낮달처럼 웅숭깊었다.
할머니는 울화병으로 자리에 누우신 할아버지를 지성으로 보살폈다. 젊어서 받던 설움을 생각하면 한소리 할 만도 한데 할머니는 가타부타하지 않았다. 편편 약골이라 늘 자리보전하던 할아버지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당신 곁을 지키던 할머니 손을 잡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다.
낮에 나와 대접 못 받는 낮달이나 구붓하게 이지러진 만월이나 저마다 존재하는 것들은 아프다. 따지고 보면 아들을 못 낳은 죄로 허허로운 삶을 살아온 할머니나 아들 핑계로 집안을 겉돌던 할아버지의 고통도 매한가지였으리라. 고통의 무게는 다르지만, 서로에게 맡겨진 불행을 깔고 주저앉아 살 수밖에 없었던 두 분의 영혼은 누가 위로할까.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40여 년이 지났지만, 낮달이 내게 주는 의미는 다르지 않다. 염탐하듯 내밀하게 걸친 낮달 위에 아직도 외가의 풍경이 겹쳐지는 것도 그 때문이지 싶다. 시(時)를 잘못 타고 나와 평생 숨죽이고 살던 할머니, 대명천지에 태어나 빛을 발하지 못하고 사신 할머니 얼굴이 골목길 낮달 안에 아슴아슴 보이는 듯하다.